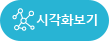디렉토리분류
- 표제어
- 분야
- 유형
- 시대
- 지역
- 집필자
-
참고문헌
-
가
- 가스름
- 가장 제주다운 사계절 꽃피는 거리 ‘공항로’
- 가족
- 가족과 궨당
- 각화해설
- 갈옷 그 특성과 전망
- 갈치속젓의 핵산관련 물질 및 유리아미노산 조성
- 갈치의 식성
- 감귤 진상과 황감제
- 감귤류자료모음집
- 감귤원예신서
- 감산향토지
- 감저전파고
- 감즙처리포의 물성에 관한 연구
- 갓일
- 강창규가출옥관계서류
- 개발제주
- 개정판 해녀연구
- 건입동지
- 건축가의 개성이 표현된 근대건축
- 건축사
- 걸어온 20년 걸어갈 20년
- 경국대전
- 경기금석대관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 전적지를 가다
- 고내리식토기의 과학적 분석연구
- 고대 탐라국의 형성
- 고대 탐라의 대외 물자 교류
- 고대 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 고대 항해술과 벌선
- 고대오의 삼천교
- 고대탐라국의 대외관계
- 고대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 고려 삼별초의 제주항전
- 고려 시대 탐라사 연구
- 고려 후기 김구의 정치활동과 학문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고려시대 삼별초의 제주 진입과 몽골의 제주 지배
-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 고려의 무산계 향리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 공장 악사의 위계
-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 고려장설화의 형성과 의미
-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연구
- 고려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 고소리술의 맥을 이어가는 고익만씨
- 고송근우선생추모무용제
- 고전 문학과 표현 교육론
- 곱들락한 제주 길 이야기-제주 문화로 만나는 도로명 이야기
- 곶자왈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곽지패총
- 관광제주
- 광복제주30년
- 광해군일기
- 교량대장
- 구도심권 활성화방안 곧 윤곽
- 구비문학개설
- 구비문학대계
- 구석기 시대의 혈거 유적에 대하여
- 구석기시대의 혈거유적에 대하여
- 구석기의 명칭 및 형태 분류
- 구제역 소강 상태...노루 생태 관찰원 재개장
- 구좌면지
- 구좌읍의 비자림지대 보존 및 정비 대책 보고서
- 구좌읍지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국내 유일 천연 바닷물 수영장...애월 국민 체육 센터 '새단장'
- 국립 중앙 박물관 도록
- 국문학통론
- 국민일보
- 국방소식
- 국어 방언 문법
- 국역대동야승
- 국제자유도시 관문으로서의 제주시 관광개선 방향
- 국조방목
- 군제60주년 남제주군지
- 규창집
- 규합총서
-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 그리스 신화보다 그윽한 신화와 전설
- 극동방송40년사
- 근대 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보고서
-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 근대 한국 재판사
-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 근대한국재판사
- 근세조선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 금기담
- 기독교인 조봉호의 순국행상
- 기록과 유물로 본 제주도의 불교
- 기상재해현상 연표
- 기억의 정원-두멩이 골목
-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 기자협회삼십년사
- 기행 가사 자료 선집
- 김녕 궤내기동굴유적의 성격에 대한 시론
- 김녕리 궤내기 동굴 유적
- 김녕리 궤내기 동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김만덕의 자선
- 김수남 아시아 문화탐험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 김우남 '제주 조천 체육관 보강 특별 교부세 4억 확보'
- 김치의 영양과 건강
- 꽃말유래 풀꽃나무 이야기
- 끝나지 않는 세월 기획안
-
나
- 나누는 기쁨 행복한 생활
- 나비 채집 20년의 회고록
- 나비박사 석주명
- 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 나비박사 석주명의 과학나라
- 나의 재직 시절
- 난지농업50년사
- 남국의 금기어 연구
- 남국의 무가
- 남국의 민속
- 남국의 민속놀이
- 남국의 속담
- 남국의 수수께끼
- 남국의 전설
- 남국의 향토음식
- 남명소승
- 남문로길
- 남사록
- 남사일록
- 남제주
- 남제주군 민요 현장조사 연구
- 남제주군서부지역 일본군 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남제주군지
- 남제주의 문화유적
- 남천록
- 남학당의 활동과 방성칠 난
- 남환박물
- 납읍 난대림지대 식물상 및식생에 관한 학술조사 보고서
- 납읍향지
- 내 고장 작은 명소 큰 자랑
- 내 고장 전통문화
-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 노동조합10년
-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 노봉문집(蘆峰文集)
- 노숙인 시설 1호 ‘제주시 희망원’
- 노형 미리내 공원
- 노형동지
- 놀이패 한라산 15년사
- 농업관측사업평가 중간보고서
- 농촌 진흥 운동기 제주 지방의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
-
다
- 다라쿳 월평동지
-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매뉴얼
- 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권한 이양 방안
- 단자사복사 제주세공마해제
- 답사 여행의 길잡이 11-한려수도와 제주도
- 대동신문
- 대외교류와 해양사
- 대정군 군병 도안 해제(大靜郡軍兵都案 解題)
- 대하실록 제주백년
- 대한매일신보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적록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 대한식물도감
- 대한제국기 미국 관료지식인의 한국 인식
- 대한제국기 미국인 고문관 문서 해제
- 대형 마트에 밀려 고객 발길 끊긴 30년 장터
- 도(道) 도로 예산 이월, 고태민 의원'한심하다'
-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조서
- 도민이 행복한 도로 건설
- 도백열전
- 도서 지방의 어촌에 관한 연구
- 도서지방의 어촌에 관한 연구
- 도서지역 발전계획
-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Ⅰ
- 도시계획40년사
- 도시공원현황
- 도시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 도제50년 제주실록
- 독립운동사자료집
- 돌의 무늬
- 돌의 민속지
- 동광리
- 동국세시기
- 동국여지승람
- 동굴 연구
- 동굴 전문 김범훈 기자의 제주도 용암 동굴 들여다보기
- 동백꽃 지다 제주민중항쟁사화집
- 동아 일보
- 동아시아 저어새 보전운동 과거 10년 미래 10년
- 동아일보
- 동양란길잡이
- 동인지 잡지로 보는 제주 문단의 흐름
- 되돌아본 세월
- 두레 농민의 역사
- 두산백과사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라
-
마
- 마을의 미 제주도
- 마을의 형성과 변천
- 만불신문
- 만언사 이본연구
- 맛있는 물의 조건
- 매계선생문집
- 매스컴대사전
- 매일신보
- 명월향토지
- 목숨보다 더 깊은 사랑... 애달픈 碑만 남았구나
- 목재민속품연구
- 몰래물 향토지
- 몽원과 제주마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 무속자료사전
- 문연서당 터
- 문화 영웅으로서의 제주 여신들
- 문화방송30년 연표
-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곽지리 금성리
- 문화유적 분포지도
-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곽지리 금성리
- 문화제주
- 물고기백과
-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 제주도와 류쿠열도의 교류
- 미술사방법론
- 미술의 해석
- 미술평단
- 미학사전
- 민구
- 민란의 시대
-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사업실적보고
- 민선자치군정 11년
- 민선자치군정 11년사
- 민속놀이
-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20년사
- 민요론집
- 민족생활어사전
- 민족의 영산 한라산
- 민주노총제주본부 제13차대의원대회
-
바
- 바다 건넌 조선인 해녀
- 바다 넘는 제주도의 해녀
-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 바다밭 이야기
- 바다와 산이 있어 아름다운 그곳 제주도
- 바람섬의 울림
-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 박물관 도록 서화류
- 박물관 소장 고문서 해제 -안민고 절목-
- 박종실의 약력
-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 방선문
-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 백록어문
- 백조일손지지의 한을 넘어서
- 벅수와 장승
- 번암집
- 범선 항해시대의 제경해로
- 범증산교사
- 벚꽃이 펄펄 쏟아지는 길
- 변방인의 세계
- 보건 환경 연구원보
- 보호대상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연구
- 봅서예 D
- 봉남비서
- 봉남선사와 유불선삼법
- 봉성문여
- 부산 금석문
- 부해문집
- 북제 주교육 50년사
- 북제주 교육 50년사
- 북제주 교육사
- 북제주교육 50년사
- 북제주군
- 북제주군 문화유적
-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 북제주군 민요 채보 연구
- 북제주군 반세기
- 북제주군 비석총람
- 북제주군 비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
- 북제주군 지명총람
- 북제주군 철새도래지의 조류보호방안
- 북제주군의 문화 유적
- 북제주군의 문화 유적 분포 지도
-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 북제주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
- 북제주군지
- 북제주지의 역사
- 북주주군지
- 북촌리유적
- 불교
- 불교 조각
- 불교 조각 1
- 불꽃의 여인 강평국
- 브로켄
- 비
- 비바리어고
- 비양도 학술조사보고서
- 빌레못 동굴 학술 조사 보고서
-
사
- 사법연감 2006
- 사수도 슴새의 번식밀도
-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 사업보고
- 사진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지형학
- 사진으로 보는 제주 목축 문화
- 사진으로 보는 제주YMCA 50년의 발자취
- 사진자료집
- 사회
- 산굼부리의 식물
- 산업 사회의 무당
- 산지천예술마당 상권 활성화 기여
- 산지천의 물과 생태
- 산천단의 솔바람 소리
- 살아남은 자의 기록
- 삶과 문화
- 삼국사기
- 삼법성전
- 삼법수도진리
-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 삼별초와 제주도
- 삼별초의 난
- 삼별초의 항쟁
-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 삼양동지
-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 상례비요
- 상모리 유적
- 상모리유적
- 상황의 질곡을 비상하는 자유의 항해 대담
- 새 주소 낯선데 또 도로 이름 바꾼다고
- 새로 쓰는 제주사
- 생명의 원류 하천과 계곡
- 생명의 젖줄 우리시의 용천수
- 생업기술 어로기술과 어로구
- 생활문화와 옛문서
- 생활상태조사
- 서귀포산 자리돔의 어획개선 및 적정이용을 위한 자원생물학적 연구
- 서귀포시의 전승 민요
- 서울신문
- 석불·마애불
- 선문대할망 설화고
- 선원총람
- 선조실록
- 선흘 벵뒤굴 학술 조사 보고서
-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 성산 표선간 국도 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내 유적발굴조사보고서
- 성읍리유적
- 성주
- 성주이씨세적
- 성찰과 지향 제주작가회의 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세계 자연 유산 해설 표준 교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 세계 환경 수도 추진 본부 녹지 환경과 보도 자료
- 세계미술용어사전
- 세시풍속
- 세조실록
- 세종갤러리 뒤돌아본 14년
- 세종실록
- 세종실록지리지
- 소방 대응 행정 자료 및 통계
- 속음청사
- 속탐라록
- 수눌음
- 수도권 지역 제주특산물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분석
- 수은문집
- 수은시집
- 수정사 원당사 지표조사보고
- 수형인명부
- 숙종실록
- 순조실록
- 시대와 삶
- 시정백서
- 식물과 천연기념물 제주도의 민속과 자연
- 신광
- 신들의 고향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축제주항쟁자료집
- 신화와 전설
- 신화학원론
- 신화학입문
- 실내수조에서 사육한 참조기 배발생 및 자치어의 형태
-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 심재 김석익
-
아
- 아라 종합 사회 복지관
- 아라리오 뮤지엄 등 전시 특화...기발난 현대 미술의 섬, 제주
- 아름다운 생태이야기
-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 아름다운 제주정신
- 아이들아 아이들아
- 안익태 선생과 탐라합창단
- 암소와 황소
- 애월읍-제주대 애조로 직통 시외버스 770번 신설
- 앵글 속 지리학(하)
- 약마희고 영등굿에서의 경조민속
- 양식산 자주복의 인공 수정란 생산
- 양악계선선사의 비
- 어구
- 어로기술과 어로구
- 언론노보
- 업무 보고 자료
- 업무보고자료
- 여걸 김시숙의 생애
- 역사 속에 나타난 조선시대 제주의 여성
- 역사재현에 있어서 영상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 역주 증보 탐라지
- 역주 탐라지
- 역주증보탐라지
- 역해 향토 문화 교육 자료(譯解 鄕土文化敎育資料集)
- 연극에 대한 추억과 변명
- 연담유일선사의 비
- 연산군일기
- 연삼로 구간 완전 개통!
- 연지
- 연합뉴스
- 열린 제주시
- 영주십경시집
- 영주어문
- 영주일보
- 영주지에 대한 고찰
- 영주풍아
- 영평마을
- 영화
- 예고
- 옛 영화는 간데없고 근·현대사 아픔의 흔적만
- 오름길라잡이
- 오름나그네
- 오정민은 누구인가
- 온평리지
- 완당평전
- 왜구의 침입과 방어시설
- 외도동 향토지
- 용담동 먹돌로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용담동 용문로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용담동 유적-제주도 탐라 형성기의 마을 모습
- 용담동고분
- 용담동지
- 용방록
- 용암수 융합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보고서
- 우당 도서관, 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다채'
- 우도 학술조사보고서
- 우도의 지형과 지질
- 우도지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 우리가 알아야 할 새 백가지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무 백가지
- 우리고장의 민속놀이
- 우리고장의 여름 향토음식 제주도 자리회 해삼토렴회 돼지새끼회
- 우리나라 민속놀이
- 우리나라 찌르개 연구
- 우리나라식물명감
- 우리문화이야기
- 우리새소리 100가지
- 우리옷이천년
- 원
- 원 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 연구
- 원 명교체기의 제주도
- 원대의 제주마 목장
- 원불교학개론
- 원색대한식물도감
- 원색한국수목도감
- 원색한국식물도감
- 원색한국어류도감
- 월간 제주
- 월간제주
- 월정리
- 유도제주
- 유람선 관광지로의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
- 유배가사 연구
- 유한라산기
- 읍지
- 읍지제주도 우도의 홍조단괴 해빈 퇴적물의 특징
- 응와전집
- 응운우능선사순공지탑
-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 조사 연구 보고서
- 의회보
- 이것이 개벽이다
- 이당 회고록
- 이세진의 제주 불교 혁신 운동 연구
- 이야기여성사
- 이어도로 간 비바리
- 이여도를 찾아서
- 이여탄어민지
- 이완희 선생 기증 유물 특별전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 인공어초 사후관리조사보고
- 인공어초 시설실적
- 인구·교통량 ‘부쩍’...치안 대응 ‘버겁다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찾아서
- 일도 2동지
- 일도2동지
-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 일본 야만인 전통의 연구
-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 일제 말기 제주도와 일본군 전쟁 유적지
- 일제 하 제주도 학교 설립 운동
-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 일제하 제주 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과 제주 야체이카 사건
- 일제하 제주 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 일제하 제주도 학교 설립 운동
-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 잊혀져 가는 문화 유적
- 잊혀져 가는 문화유적
-
자
- 자산어보
-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 자연지리학사전
- 자연환경과 인간
- 재일 제주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 재일조선인사연표
- 재해백서
- 쟁의특보
- 저어새
- 저어새 월동지인 성산포와 하도리의 서식환경 및 보호방안
- 저어새의 도래현황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어새의 지속적인 서식을 위한 서식실태조사와 서식지 환경특성 분석
- 전국 국제스포츠대회 추진 계획
- 전국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 전라남도의 정기시 구조와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지
- 전문가리포트 1백여 오름에 갱도진지 구축
- 전시회 도록
- 전은자의 제주 바다를 건넌 예술가들⑫ 유배지 스승 찾아 제주 바다를 건너다 소치 허련(小癡 許鍊)
- 전통 사찰 총서
- 전통문화의 뿌리
- 전통사찰총서
- 젊은이를 위한 제주민요
- 정구용판결문
- 정기총회 자료
- 정려비에 나타난 제주인의 효행연구
- 정밀토양도
- 정신 건강론
- 정신문화연구
- 정조실록
- 정책세미나 자료
-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 제14호 태풍 매미 보고서
- 제15회 전시회도록
-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를 마치고
-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 제1회 제주학생종합예술제
- 제3기 제주시 지역 사회 복지 계획(2015~2018)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사회 복지 계획
-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요강
- 제58군배비개견도
- 제5장 해전과 해양사
-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최종 보고서
- 제83회 전국체전 백서
-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
- 제남신문
- 제농 80년사
- 제동목장자료
- 제민일보
- 제민일보소식지
- 제주 100년
-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 제주 4·3 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제주 4·3 유적
- 제주 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 제주 4·3의 전개 과정과 미군정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 60대 사건 태풍 사라 제주 강타
- 제주 ‘조설대’에 서린 항일정신 잇는다
- 제주 걷기 여행
-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 제주 공항로 가로수 ‘후박나무’로 새 단장
- 제주 관광 반세기
- 제주 관광메뉴얼
- 제주 교육 행정사
- 제주 교육사
- 제주 교통사 소고
- 제주 국제 자유 도시기본계획
- 제주 국제 자유 도시보완계획안
- 제주 국제 자유 도시종합계획 2002~2011
- 제주 김녕리 유적
- 제주 대학교 병원
- 제주 돌 바람 그 문화와 자연
- 제주 동명리 유적
- 제주 동부 보건소, ‘행복하려면 건강합시다’ 캠페인 전개
- 제주 문화 상징
- 제주 문화 예술 현황
- 제주 백아도 진남포 지질도폭 설명서
- 제주 별빛누리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 북촌리 유적
- 제주 불교 문화재 자료집
- 제주 사법사
- 제주 사회 복지 발자취
- 제주 사회 복지 협의회 25년사
- 제주 상의 60년사
- 제주 서사무가에 나타난 어휘 형성 연구
- 제주 섬 한바퀴 도는 환상 자전거 도로 올해 뚫린다
- 제주 성읍 마을
- 제주 성읍리유적
- 제주 소방 행정사
-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 제주 애월 체육 센터 게이트볼장 준공...'생활 체육의 기회 확대'
- 제주 애월도폭 지질보고서
- 제주 언론사
- 제주 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 제주 여성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 제주 여성의 삶과 공간탐구
- 제주 역사 기행
- 제주 오현 조사
- 제주 올레-제주시 가이드북
- 제주 용담동 월성로 유적
- 제주 용담동 유적
- 제주 용암 해수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보고서
- 제주 유배 문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사업 보고서
- 제주 유배가사 연구
- 제주 유배문학 연구
- 제주 인명 사전
- 제주 자연 생태가 함께 숨쉬는 '사려니 숲길'
- 제주 자치 경찰 관광 환경 업무 특화
- 제주 재래가축 편람
- 제주 전승동요
- 제주 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 제주 전통혼례와 음식문화에 관한 민속지적 묘사
- 제주 젓갈의 내력과 요리
- 제주 조랑말
- 제주 조천 체육관, 4억 특별 교부세 지원
- 제주 종달리유적
- 제주 지역 목장사와 목축 문화
- 제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 학술 세미나
-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 제주 토종돼지의 사육과 식문화
- 제주 하원동 분묘군
- 제주 항일 독립운동사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
- 제주 해녀 항일 투쟁 실록
-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 제주 향토 문화 사전
- 제주 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제55호] 고시
- 제주 흑우 천연기념물 제546호 지정!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제주4·3사건자료집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제주4·3유적
-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정관
- 제주감귤농협 40년사
- 제주감귤도감
- 제주건축의 맥
-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 제주계록
- 제주고내리유적발굴조사개보
- 제주고산리유적
- 제주고산향토지
- 제주고씨족보
- 제주곽지패총
- 제주관광가이드
- 제주교안 이후 제주지역 천주교회의 동향
- 제주교육사
- 제주교육소식
- 제주교육행정사
- 제주교통사소고
- 제주국제공항착륙부지내 확장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
- 제주규제자유지역의 추진 여건과 실현방안
- 제주근해산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의 연령과 성장에 관한 연구
- 제주금성리유적
- 제주기협회보
- 제주노회사
- 제주농요
- 제주대정정의읍지
-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
-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
- 제주도
- 제주도 50년사
-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 제주도 가족과 궨당
-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 제주도 고고학 연구
- 제주도 고고학의 재조명
- 제주도 곤충
- 제주도 곤충상
- 제주도 구석기 유적 부존 가능성
- 제주도 구석기문화의 재검토
- 제주도 구석기유적 부존가능성
-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 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
-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관찰
-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 제주도 기독교 개신교 시군읍면별 교회 분포 현황
- 제주도 기후특성집
- 제주도 김녕-월정 해안 사구 지역의 환경 변화 연구
- 제주도 노동요 연구
- 제주도 당굿과 경제
- 제주도 당신앙 연구
- 제주도 도감의례
- 제주도 동굴유적의 성격
- 제주도 동부지역 지하분포 화산암류의 40Ar-39Ar 연대와 화산활동 해석
- 제주도 마애명
-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Ⅰ
- 제주도 목장사
- 제주도 목재민속품
-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 제주도 무문 토기문화의 연구현황과 과제
-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연구현황과 과제
-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 제주도 무속논고
- 제주도 무속신화
- 제주도 무속연구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 제주도 무의의 기메고
- 제주도 무형문화재 음악연구
-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 제주도 무혼굿
- 제주도 문제의 유래
- 제주도 문화 스포츠 교통 현황
- 제주도 물장오리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보고서
- 제주도 민간 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 제주도 민간요법
- 제주도 민담
- 제주도 민속
- 제주도 민속음악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조사보고서
- 제주도 민요연구
-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
- 제주도 바다와 산이 있어 아름다운 그곳
-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 제주도 방언집
-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사회복지단체편람
- 제주도 상 장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의 교육적 의미 연구
- 제주도 상 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 제주도 서검은오름의 양치식물상
- 제주도 석재민속품
-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의 월동 행동 및 생태
-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의 월동생태 및 관리방안
- 제주도 세시풍속
- 제주도 소금밭
- 제주도 속담사전
-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보고서
- 제주도 수자원개발사
- 제주도 수필
- 제주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 제주도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
- 제주도 신석기 시대 토기 변천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신석기 시대 토기의 형식과 시기 구분
-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 변천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의 형식과 시기구분
- 제주도 신화
- 제주도 신화와 전설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 제주도 신화전설
- 제주도 여말 선초 분묘 연구
-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고학적 측면
- 제주도 연극협회
- 제주도 연근해 연속식채낚기어구의 생력화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안의 수온 염분 변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안의 해황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 제주도 우도의 홍조 단괴 해빈 퇴적물의 특징과 형성 조건·예비 연구 결과
- 제주도 유적
- 제주도 유치원 교육의 발전과정 조사 연구 및 실태
- 제주도 음식문화
- 제주도 의사회 60년사
- 제주도 일반 동산 문화재
-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재
-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
- 제주도 일본군 진지 동굴 전쟁 유적 조사 보고서
- 제주도 일본군 진지 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 제주도 자료집
- 제주도 잠수굿 연구
- 제주도 장례의식요
- 제주도 적갈색 경질 토기 연구
-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연구
- 제주도 전래농기구
- 제주도 전설
- 제주도 전설지
- 제주도 전적종합조사보고
-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 제주도 제주마
- 제주도 조류연구사에 관한 고찰
- 제주도 조류의 개관
- 제주도 조면암류의 지화학적 특징
- 제주도 조상본풀이 연구
-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 제주도 주변 무인도의 조류상
- 제주도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조류현황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죽재민속품
-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자료집
- 제주도 지석묘 조사 연구
-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 제주도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지질 공원 신청서
- 제주도 지질 여행
- 제주도 지질여행
- 제주도 지하수 이용 및 관리연혁
-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
- 제주도 천연 동굴 일제 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천연 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천연동굴 내 문화유적 기초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철재민속품
- 제주도 체육사
- 제주도 체육회 50년사
- 제주도 초재민속품연구
- 제주도 최초 근대 여학교 신성 여학교 연구
- 제주도 추는굿
- 제주도 출토 한대 화폐유물의 한 예
- 제주도 큰굿자료
- 제주도 통속음악
- 제주도 포구연구
- 제주도 하천의 특성과 보전 방향 환경의 날 하천토론자료
- 제주도 함덕연안 각망어업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제주도 해안 육조류의 군집구조에 관한 분석
- 제주도 해안 지역의 경관적 특성
- 제주도 해안 지역의 자연환경
- 제주도 해안습지 조사보고서
- 제주도 해안을 가다
- 제주도 해안지역의 자연환경
- 제주도 해양수산현황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단 요구 표출 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곤충
- 제주도내 풍력자원 조사에 관한 연구 용역
- 제주도류인전(濟州島流人傳
- 제주도립도서관약사
- 제주도립예술단사
- 제주도마애명
- 제주도목장사
- 제주도무가
- 제주도민속자료
-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 호상옷과 상복
- 제주도방언연구
- 제주도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 제주도부락지
- 제주도사 논고
- 제주도세요람
- 제주도속담연구
- 제주도수필집
- 제주도신축년교난사
- 제주도실기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 동굴 및 진지 현황과 구조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 동굴의 구조적 유형과 병력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구조적 유형과 병력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현황과 구조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의 구조적 유형과 병력
- 제주도에 도래하는 월동조류의 현황
-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흑로의 산란수 알의 크기 번식주기
- 제주도에서 팔색조의 분포와 서식환경
-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 결전 준비
- 제주도에서의 흑로의 번식지와 영소습성
- 제주도연구
- 제주도연안 멸치초망어업의 조업생력화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제주도요지 조사보고
- 제주도유인전
- 제주도유적
- 제주도음식
- 제주도음식문화
- 제주도의 1인가족 연구
- 제주도의 3걸인 중 1인 강창보 선생 투쟁사
- 제주도의 경제
- 제주도의 공물진헌에 대한 고찰
- 제주도의 굿춤
- 제주도의 기층문화
- 제주도의 기후적 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제주도의 농기구
- 제주도의 무속음악
- 제주도의 무속의례
- 제주도의 문화유산
- 제주도의 방사용 탑
- 제주도의 사후혼연구
- 제주도의 상제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 제주도의 식생활
- 제주도의 염전과 소금 생산방식
- 제주도의 영등굿
- 제주도의 오름과 보전
- 제주도의 유식 부락제
- 제주도의 의료
-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 제주도의 전통문화
- 제주도의 지형과 지질
- 제주도의 천연 동굴
- 제주도의 천연동굴
- 제주도의 천주교
- 제주도의 친족조직
- 제주도의 토양과 농업자원 제주도 토양의 분류와 특성 및 관리 문제
- 제주도의 통혼권
- 제주도의 해안 지형과 보전
- 제주도의회사
- 제주도적십자50년사
- 제주도전래농기구
- 제주도전설
- 제주도전설지
- 제주도정
- 제주도지
- 제주도체육사
- 제주도체육회 50년사
- 제주도포구연구
- 제주도학
- 제주도해녀
- 제주동명리유적
- 제주마의 보존 및 활용 심포지움
- 제주마의 역사 생산 및 활용방안 제2회 제주마 축제기념 학술세미나자료
- 제주만화작가회전 창립 팜플렛
- 제주만화작가회전 팜플렛
- 제주말고기 음식문화와 영양기능성
- 제주메밀의 내력과 영양
- 제주목관아지
- 제주목지지총람
- 제주무속학사전
- 제주무인도 학술조사
- 제주문단사
- 제주문예연감
- 제주문학
- 제주문화
- 제주문화론
- 제주문화방송삼십년사
- 제주문화예술
- 제주문화예술백서
- 제주문화예술현황
- 제주문화유산 들여다보기
- 제주문화자료총서
- 제주문화재연구
- 제주미술
- 제주미술인작품집
- 제주미협 40년사
- 제주민속유적
- 제주민속의 멋
-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 제주민속주의 이해
- 제주민예총
- 제주민요
- 제주민요 기능과 사설의 현장론적 연구
- 제주민요의 기능과 사설의 현장론적 연구
-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 제주민요의 이해
- 제주민의 삶과 문화
- 제주민의 항쟁
- 제주바다
- 제주바다의 채소 톨 톳의 영양과 실용조리
- 제주반세기
- 제주발전포럼21
- 제주방송사
- 제주방언 문법연구
- 제주방언 형태변화 연구
- 제주방언연구
-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 제주병제봉대총록
- 제주부령사요람
- 제주불교
- 제주불교총서
- 제주사 연표
- 제주사 인명 사전(濟州史人名事典
- 제주사 인명 사전(濟州史人名事典)
- 제주사법사
- 제주사인명사전
- 제주사자료총서
- 제주삼다수와 국내외 먹는샘물 수질 비교
- 제주삼양동유적
- 제주삼읍도총지도
- 제주삼읍전도
- 제주상공회의소 설립관계
- 제주상의 50년사
- 제주상의 60년사
- 제주상의 65년사
- 제주선교 70년사
- 제주선현지
- 제주설화집성
- 제주소리꾼
- 제주속담사전
- 제주속담총론
- 제주속오군적부
- 제주수산60년사 1946-2006
- 제주순무어사서계
- 제주습지
- 제주시
- 제주시 50년사
- 제주시 가정의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제주시 교육 50년
- 제주시 교육사
- 제주시 교통 변화의 50년
- 제주시 도로·광장·공원 237곳에 특성 살린 명·별칭 부여
- 제주시 도시계획 40년사
-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및 주변재래시장 경영혁신 연구
- 제주시 동지역 새주소(로급) 도로 구간 및 도로명 조서
-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연구
- 제주시 문화유적
- 제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제주시 비석일람
- 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 제주시 삼대 하천의 생태계 학술조사보고서
- 제주시 수협사
- 제주시 신산 공원 성화 도착 기념 조형물 공정 65% 진척
- 제주시 애월 체육 센터, 어르신 아쿠아로빅 교실 운영
- 제주시 애월 체육 센터·외도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 추진
- 제주시 옛지명
- 제주시 오십년용사담
- 제주시 외도동유적
- 제주시 외도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시 원도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제주시 인구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 제주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제주시 통계연보
-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제주시 한경 해안 도로 ‘성 김대건 해안로’ 명명
- 제주시, 애월 수영장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 제주시, 애조로 포장면 보수 공사 완료
- 제주시교육 50년
- 제주시군개발계획
- 제주시에 ‘만덕로’등장
- 제주시용담동 유적
- 제주시의 공원
- 제주시의 문화유적
- 제주시의 방어유적
- 제주시의 비석일람
- 제주시의 옛터
- 제주시의 종교
- 제주시정
- 제주시지
- 제주신문
- 제주신문오십년사
- 제주신보
- 제주실록
- 제주어 비바리 어휘에 대하여
- 제주어 사전
- 제주언론사
- 제주언론인
- 제주에 ‘별 볼일 생겼다’
- 제주여고 50년사
- 제주여성문화
- 제주여성전승문화
- 제주여인상
- 제주역사기행
- 제주역사문화관광 가이드북
- 제주예술
- 제주예술문화현황
- 제주옹기
- 제주옹기공예
- 제주와 오키나와
- 제주우정100년사
- 제주유맥 육백년사
- 제주음악의 개척자 김국배
- 제주음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제주읍지
- 제주의 가례
- 제주의 관문 공항로 13억원 들여 말끔히 정비
- 제주의 기록문화
- 제주의 돌문화
- 제주의 마을
- 제주의 마을시리즈
- 제주의 명수 이용과 보전방안
- 제주의 명절과 음식문화
- 제주의 명절음식과 음식문화
- 제주의 무속
- 제주의 무속 신앙과 신종교
- 제주의 문화재
- 제주의 문화재 안내문안집
- 제주의 물 용천수
-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 제주의 민속
- 제주의 민요
- 제주의 바다
- 제주의 방어유적
- 제주의 불적
- 제주의 비
- 제주의 비(碑)
-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 제주의 상권 관덕로 ①
- 제주의 상권 관덕로②
- 제주의 상권 남성로 ③
- 제주의 상권 남성로 ④
- 제주의 상권 동광로 ①
- 제주의 상권 동광로 ③
- 제주의 상권 시리즈
- 제주의 상권 탑동로 ①
- 제주의 상권 탑동로 ②
- 제주의 서당 교육
- 제주의 선사유적
- 제주의 성곽
- 제주의 소리
- 제주의 술
- 제주의 언어
- 제주의 역사와 문화
- 제주의 옛 지도
- 제주의 오름
- 제주의 인맥
- 제주의 전통문화
- 제주의 전통음식
- 제주의 지하수
- 제주의 천연염색
- 제주의 폐사지
- 제주의 해녀
- 제주의 해안습지
- 제주의 핵심 삼도2동
- 제주의 향토민요
- 제주의 허파 곶자왈
- 제주의소리 창간1주년기념 자료집
- 제주인
- 제주인명록
- 제주인의 3·1 운동과 그 영향
-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 제주인의 삶과 돌
- 제주인의 심성을 닮은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 제주인의 항일 운동
- 제주인의 항일운동
- 제주일보
- 제주일보 60년사
- 제주자생 상록수도감
- 제주재래감귤의 분류와 유용형질
- 제주저널
- 제주전기 77년 제주도 전력사
- 제주전설집성
- 제주전통두부 둠비의 역사와 두부요리
- 제주전통음식
- 제주전통음식의 이해
- 제주전통주거에서의 여성공간
- 제주주 김녕-월정 사구의 발달 과정에 관하여
- 제주지방 50년사
- 제주지방 과거와 현재
- 제주지방의 기상관측 역사와 기후 변동성 연구
- 제주지역 가창유희요 고찰
- 제주지역 재래돼지의 특성과 활용현황
- 제주지역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 제주지역어의 음운론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뉴스레터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소식
- 제주참언론소식
- 제주천주교회 100년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개발사업고시
- 제주청년
- 제주체육
- 제주체육 비전 2000
- 제주춤 무보집
- 제주충효열지
- 제주타임스
- 제주태권도 50년사
- 제주토속주 조사연구
- 제주토속지명사전
- 제주통계연보
- 제주통사
- 제주투데이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생체육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시설 단체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경기단체 등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보고서
- 제주판화가협회 전시도록
- 제주풍토록
- 제주하모리유적
- 제주하원리호적중초
-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제주합창의 발자취
- 제주항일독립운동사
- 제주항일인사실기
- 제주해녀사 재조명
- 제주향교지
- 제주향토음식론
- 제주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
- 제주현대문학사
- 제주형 스포츠 발전 모델
- 제주화보
- 조기유자망 조업시스템 개량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조명과 조명구
- 조사연구보고서
- 조선 시대 전기
- 조선 시대 제주도의 군현 구조와 지배 체제
- 조선 중기 제주 유민의 발생과 대책
- 조선 후기 제주 지역의 수취 체제와 주민의 경제 생활
- 조선 후기 제주 환곡제의 군영 실상
- 조선군개요사
- 조선불교
- 조선불교혁신전도승려대회 회의록
- 조선비망록
- 조선사회운동사사전
- 조선상식
- 조선시기 제주 신인 기사 검토
- 조선시대 전기
-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관계 연구
-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
- 조선시대 제주마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 조선시대 제주마 관설목장의 관계 연구
- 조선시대 후기
- 조선왕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 조선왕조실록의 서화자료
- 조선인명사전
- 조선일보
- 조선전기 관방시설의 정비과정
- 조선전기 성곽기능고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 조선환여승람
-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 조선후기 제주 환곡제의 군영실상
- 조선후기 제주비방의 군사제도
-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 조설대에 새긴 애국지사의 구국 정신 계승
- 조천 농협, 제5회 원로 조합원 게이트볼 대회 개최
- 조천 도서관 '인터넷보다 독서삼매경' IT 나눔 운동으로 선정
- 조천읍지
- 종교계의 항일 운동
- 종달리 유적
-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운영 방안
-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 개발
- 주요 관광 행정 현황
- 주요 행정총람
- 주요업무보고
- 죽음의 예비검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배분
- 중약대사전
- 중종실록
- 증보 제주 통사
- 증보 제주통사
- 증보 탐라지
- 증보본초비요
- 증보탐라지
- 지리사전
-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 지방 자치와 지방 정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지방과학기술연감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 지방행정구역요람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지역 사회 복지 실천 현장의 이론과 사례
- 지역혁신사업안내
- 지영록
- 지질학 개론
- 지형학
- 진중신문
- 집쥐에 의한 슴새 번식성공률 감소
- 짚 풀공예
-
차
- 찬물교 연구 서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평가와 과제
- 참조기 조미건포류의 이화학적 특성
- 창립 30주년 사진집
- 창립10주년 기념 사진작품집
- 창립전시회 도록
- 천기대요
- 천연 바닷물 수영장 애월 국민 체육 센터,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의 식물상 문화관광 해설사교육
- 천제연계곡의 식물상 연구
- 천주교
- 청암선생
- 체육 스포츠사 연구
- 초가
-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도래한 월동 수조류 조사
- 추사와 그의 시대
- 추자도
-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 추자도 학술조사보고서
- 추자도의 조류상
- 추자도지
- 추자마을 사랑지도 자혜집
- 출입국·외국인 통계 월보
- 충암집
- 취락을 통해서 본 탐라의 성립과 전개
- 취락지리학
- 칠성로 공사 구간서 옛 우물. 철기 시대 유물 확인
-
타
- 탐라 성주 고봉례 묘 추정지-제주시 화북동 분묘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 탐라 이전의 사회와 탐라국의 형성
- 탐라 인물고
- 탐라계록의 이두문과 이두 해독
- 탐라국 입춘굿놀이
- 탐라국사료집
- 탐라기년
- 탐라록
- 탐라명감
- 탐라문헌집
- 탐라문화
- 탐라방영총람
- 탐라사료문헌집
- 탐라사자료집록
- 탐라성립기 취락의 형성과 변천
-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보고서
- 탐라순력도
-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 탐라순력도연구논총
- 탐라어연구
- 탐라의 명칭과 대외 관계
- 탐라의 효자 열녀전
- 탐라입춘굿놀이
- 탐라지
- 탐라지 초본(상)
- 탐라지 초본(하)
- 탐라지초본
- 탐영방영총람
- 태종실록
- 태평양 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 시설
- 태평양 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 태풍백서
- 토정비결
- 통계연보
- 통과의례 속의 제주여성 풍속 전승 양상
- 통시문화고 제주도 서민문화의 일단면
- 통일법요집
- 특별 자치 마을 만들기팀 보도 자료
- 특별자치도 출범 그 간의 성과와 과제
-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향후 전망
- 파
-
하
- 하늘빛으로 물든 새
- 하도 마을 종합 발전 계획
- 하도 향토지
- 하도리의 생업민속
- 하도향토지
- 하멜표류기
- 하모리유적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관리
- 학명비음기
- 한국 고고학 전문 사전
- 한국 고전 문학과 세계 인식
- 한국 민속 신앙 사전: 무속 신앙 편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 한국 신문 백년
- 한국 신문사
- 한국 신문사 연구
- 한국 신종교 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 언론사
- 한국 연근해 갈치 Trichiurus lepturus Linnaeus의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
- 한국 연근해 갈치 Trichiurus lepturus의 분포와 회유
- 한국 연안산 검복과 자주복의 독성
- 한국 오페라에서 동굴음악까지 낙관심
- 한국 장수도 변화의 공간적 특성
- 한국 전쟁과 불교 문화재
- 한국 전쟁사
- 한국 전쟁의 포로
- 한국 지석묘 고인돌유적 종합조사 연구
- 한국 철도 차량 100년사
- 한국 최초의 어보 우해이어보
- 한국 해양문학 연구
- 한국 현대언론사론
- 한국고고학사전
-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한국고문서연구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한국구비문학대계
- 한국기독교 역대인물
- 한국기독교 인물 탐구
- 한국기후표
- 한국농작물백과도감
- 한국동식물도감
- 한국마정사
-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 한국민간설화집
- 한국민속대사전
-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식생활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한국민요대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 한국민족종교총람
- 한국방송사
- 한국방송육십년사
- 한국방송칠십년사
- 한국복식2천년
- 한국복식사연구
- 한국불교인명사전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 한국산 참복과 복어목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 한국산 참복아목 어류
- 한국서점편람
- 한국세시풍속사전
- 한국수목도감
- 한국수산지
- 한국수수께끼사전
- 한국식물검색집
- 한국식물명고
-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아나키즘운동사
- 한국어구도감
- 한국어도보
- 한국원예식물도감
- 한국은행 제주지점 25년사
- 한국의 고문서
- 한국의 금기어 길조어
- 한국의 기상재해조사
- 한국의 기후
- 한국의 난초
- 한국의 농요
- 한국의 미
- 한국의 민가연구
- 한국의 보약
- 한국의 사찰문화재
- 한국의 살림집
- 한국의 신화
- 한국의 옛집
- 한국의 장시
- 한국의 전설
- 한국의 전통공예
- 한국의 종교
- 한국의 지질 유산
- 한국의 해녀
- 한국의 해양문화
- 한국인명대사전
-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 한국전쟁기 제주 문단과 문학
-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 한국전쟁기의 제주문단과 문학
- 한국전통복식문화연구
- 한국조류생태도감
- 한국종교문화의 현황과 특징
- 한국지리지
- 한국지명요람
- 한국지명총람
- 한국지지
- 한국케이블TV5년
- 한국하천 일람
- 한남 서성로간 도로확 포장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한라병원보
- 한라봉 감귤 저온저장의 경제성 분석
- 한라산
- 한라산 관음사 4·3위령제 봉행 자료
- 한라산 남사면의 조류 군집 구조에 관한 연구
- 한라산 산림조류의 군집에 관한 연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 한라산과 지명
-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 연구
-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보고서
- 한라산내 5개 지역의 포유류상
- 한라산에서 팔색조의 분포와 번식 생태
- 한라산의 구비전승 지명 풍수
- 한라산의 동물
- 한라산의 식물
- 한라산의 인문지리
- 한라산의 지명
- 한라산의 천연기념물 조류 조사
- 한라산의 하천
- 한라산이야기
- 한라수목원 식물목록
- 한라연감
- 한라일보
- 한라일보 노보
- 한라일보뉴스
- 한말 일본의 제주 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 한시속의 새 그림 속의 새
- 한올레
- 한중일 국제 환경사진 문화교류전 도록
- 한중일 삼국 신종교실태의 비교연구
- 한천 주변의 상고 문화의 형성과 전개
- 한천주변의 상고문화의 형성과 전개
- 합천 봉계리유적
- 항일 순국한 신앙인 조봉호 국난극복인물
- 해녀 노젓는 노래의 현장론적 연구
- 해녀항쟁독립유공자 부춘화 김옥련
- 해륜사지
- 해방 직후의 제주 문학
- 해양군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 해양군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행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정책
- 향토민요와 문화
- 향토사 교육 자료
- 향토사교육자료
- 향토요리교재
- 향토지
- 헌법학 개론
- 현대 신종교의 이해
-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 현대한국어구도감
- 현황 자료
- 협재 동굴 지대 학술 조사 보고서
- 형사사건부
- 홍정표 선생
- 홍화각기
- 화가 강태석의 삶과 예술
- 화북 조천 비석거리 신음 비문 없어지고 표면 크게 변형
- 화북동향토지
- 화북포구지표조사보고서
- 화산
- 화산섬 돌 이야기
- 화산섬, 제주 문화재 탐방
-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
- 화산이 빚은 제주도 지질 공원
- 환경 보전국 산림 휴양 정책과 보도 자료
- 환경백서
- 환경스페셜
- 환성당지안대종사행장
- 환해장성연구
- 회명문집
- 회칙 발기취지문
- 효열록
- 효전 심노숭 문학연구
- 흑오미자 자생 임분의 입지환경과 식생구조
- 흥미계
-
가
| 항목 ID | GC00710851 |
|---|---|
| 한자 | 巖石鹽田 |
| 영어음역 | amseok yeomjeon |
| 영어의미역 | rock salt field |
| 이칭/별칭 | 소금빌레 |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집필자 | 고광민 |
[정의]
제주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비교적 너른 바위 위에서 소금을 얻는 형태의 염전.
[개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 지역은 암석염전에서 간석염전(干潟鹽田)으로 염전 형태가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자취가 뚜렷이 남아 있는 암석염전으로는 애월읍 구엄리의 구엄염전이 있다. 구엄리 암석염전의 대부분은 비교적 높은 곳에 있어 겨울 외에는 조수의 조건에 구속받음이 없이 제염(製鹽)이 이루어졌다.
염전 하나의 규모는 보통 82.5㎡ 안팎이었는데 염전마다 여섯 개의 증발지(蒸發池)를 마련하였는데 하나의 증발지 규모는 약 14㎡ 안팎이었다. 증발지는 ‘물아찌는돌’ 또는 ‘호겡이’라고 하였다. 암석염전은 소금빌레라고도 하였는데, 빌레는 너럭바위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소금 생산 방법]
암석염전에 이용하는 암석은 평평한 암석이라고는 하지만 균열이 나 있기 마련이었는데 그 틈을 따라 찰흙으로 둑을 쌓았으며, 둑의 폭과 높이는 약 15㎝ 안팎이었다. 이때의 둑을 ‘두렁’이라 하고, 둑을 만드는 일을 ‘두렁막음’이라고 하였다.
증발지에서 직접 소금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곧 천일염이었으며, 천일염을 만드는 증발지를 ‘소금돌’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염전이 거느리는 여섯 개의 증발지 중 ‘물’이라고 하는 함수(鹹水)를 만드는 증발지가 넷이면 천일염을 만드는 증발지는 둘이었다.
증발지에서 물을 만드는 일을 두고 ‘춘다’라고 하였는데, ‘추다’라는 말은 증발지에 바닷물을 담아 놓아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일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허벅에 바닷물을 담아 날라 증발지에 부었으며, 염분의 농도에 따라 증발지를 바꿔나갔다. 증발지에서 해수를 증발시키며 함수를 만들어 가는 동안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 소금돌, 곧 최종 증발지에서 천일염을 만들지 못한 함수는 일정한 곳에 따로 담아 두었다.
함수를 담아 두는 곳을 ‘혹’이라고 하였는데, 혹은 찰흙과 돌멩이로 만든 붙박이 항아리를 가리키며, 혹 위에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덮는 이엉을 ‘람지’라고 하였다.
혹에 담아 두었던 함수를 다시 증발지에서 증발시키며 천일염을 만들기도 하였고, 밥솥에서 달여 자염(煮鹽)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함수를 밥솥에서 달여 소금을 만드는 일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졌다.
증발지에서 증발로만 만든 소금을 ‘돌소금’이라 하고 함수를 밥솥에서 달여 만든 소금을 ‘은 소금’이라고 하였는데, 돌소금이 은 소금보다 넓적하고 굵었으며 맛도 뛰어나 은 소금보다 인기가 많았다.
- 고광민, 「제주도의 염전과 소금 생산방식」(『조선시대 소금생산방식』, 신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