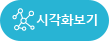디렉토리분류
- 표제어
- 분야
- 유형
- 시대
- 지역
- 집필자
-
참고문헌
-
가
- 가스름
- 가장 제주다운 사계절 꽃피는 거리 ‘공항로’
- 가족
- 가족과 궨당
- 각화해설
- 갈옷 그 특성과 전망
- 갈치속젓의 핵산관련 물질 및 유리아미노산 조성
- 갈치의 식성
- 감귤 진상과 황감제
- 감귤류자료모음집
- 감귤원예신서
- 감산향토지
- 감저전파고
- 감즙처리포의 물성에 관한 연구
- 갓일
- 강창규가출옥관계서류
- 개발제주
- 개정판 해녀연구
- 건입동지
- 건축가의 개성이 표현된 근대건축
- 건축사
- 걸어온 20년 걸어갈 20년
- 경국대전
- 경기금석대관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 전적지를 가다
- 고내리식토기의 과학적 분석연구
- 고대 탐라국의 형성
- 고대 탐라의 대외 물자 교류
- 고대 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 고대 항해술과 벌선
- 고대오의 삼천교
- 고대탐라국의 대외관계
- 고대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 고려 삼별초의 제주항전
- 고려 시대 탐라사 연구
- 고려 후기 김구의 정치활동과 학문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고려시대 삼별초의 제주 진입과 몽골의 제주 지배
-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 고려의 무산계 향리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 공장 악사의 위계
-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 고려장설화의 형성과 의미
-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연구
- 고려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 고소리술의 맥을 이어가는 고익만씨
- 고송근우선생추모무용제
- 고전 문학과 표현 교육론
- 곱들락한 제주 길 이야기-제주 문화로 만나는 도로명 이야기
- 곶자왈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곽지패총
- 관광제주
- 광복제주30년
- 광해군일기
- 교량대장
- 구도심권 활성화방안 곧 윤곽
- 구비문학개설
- 구비문학대계
- 구석기 시대의 혈거 유적에 대하여
- 구석기시대의 혈거유적에 대하여
- 구석기의 명칭 및 형태 분류
- 구제역 소강 상태...노루 생태 관찰원 재개장
- 구좌면지
- 구좌읍의 비자림지대 보존 및 정비 대책 보고서
- 구좌읍지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국내 유일 천연 바닷물 수영장...애월 국민 체육 센터 '새단장'
- 국립 중앙 박물관 도록
- 국문학통론
- 국민일보
- 국방소식
- 국어 방언 문법
- 국역대동야승
- 국제자유도시 관문으로서의 제주시 관광개선 방향
- 국조방목
- 군제60주년 남제주군지
- 규창집
- 규합총서
-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
- 그리스 신화보다 그윽한 신화와 전설
- 극동방송40년사
- 근대 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보고서
-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 근대 한국 재판사
-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 근대한국재판사
- 근세조선의 의녀제도에 관한 연구
- 금기담
- 기독교인 조봉호의 순국행상
- 기록과 유물로 본 제주도의 불교
- 기상재해현상 연표
- 기억의 정원-두멩이 골목
-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 기자협회삼십년사
- 기행 가사 자료 선집
- 김녕 궤내기동굴유적의 성격에 대한 시론
- 김녕리 궤내기 동굴 유적
- 김녕리 궤내기 동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김만덕의 자선
- 김수남 아시아 문화탐험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 김우남 '제주 조천 체육관 보강 특별 교부세 4억 확보'
- 김치의 영양과 건강
- 꽃말유래 풀꽃나무 이야기
- 끝나지 않는 세월 기획안
-
나
- 나누는 기쁨 행복한 생활
- 나비 채집 20년의 회고록
- 나비박사 석주명
- 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 나비박사 석주명의 과학나라
- 나의 재직 시절
- 난지농업50년사
- 남국의 금기어 연구
- 남국의 무가
- 남국의 민속
- 남국의 민속놀이
- 남국의 속담
- 남국의 수수께끼
- 남국의 전설
- 남국의 향토음식
- 남명소승
- 남문로길
- 남사록
- 남사일록
- 남제주
- 남제주군 민요 현장조사 연구
- 남제주군서부지역 일본군 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남제주군지
- 남제주의 문화유적
- 남천록
- 남학당의 활동과 방성칠 난
- 남환박물
- 납읍 난대림지대 식물상 및식생에 관한 학술조사 보고서
- 납읍향지
- 내 고장 작은 명소 큰 자랑
- 내 고장 전통문화
-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 노동조합10년
-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 노봉문집(蘆峰文集)
- 노숙인 시설 1호 ‘제주시 희망원’
- 노형 미리내 공원
- 노형동지
- 놀이패 한라산 15년사
- 농업관측사업평가 중간보고서
- 농촌 진흥 운동기 제주 지방의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
-
다
- 다라쿳 월평동지
-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매뉴얼
- 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권한 이양 방안
- 단자사복사 제주세공마해제
- 답사 여행의 길잡이 11-한려수도와 제주도
- 대동신문
- 대외교류와 해양사
- 대정군 군병 도안 해제(大靜郡軍兵都案 解題)
- 대하실록 제주백년
- 대한매일신보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적록
-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 대한식물도감
- 대한제국기 미국 관료지식인의 한국 인식
- 대한제국기 미국인 고문관 문서 해제
- 대형 마트에 밀려 고객 발길 끊긴 30년 장터
- 도(道) 도로 예산 이월, 고태민 의원'한심하다'
-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조서
- 도민이 행복한 도로 건설
- 도백열전
- 도서 지방의 어촌에 관한 연구
- 도서지방의 어촌에 관한 연구
- 도서지역 발전계획
-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Ⅰ
- 도시계획40년사
- 도시공원현황
- 도시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 도제50년 제주실록
- 독립운동사자료집
- 돌의 무늬
- 돌의 민속지
- 동광리
- 동국세시기
- 동국여지승람
- 동굴 연구
- 동굴 전문 김범훈 기자의 제주도 용암 동굴 들여다보기
- 동백꽃 지다 제주민중항쟁사화집
- 동아 일보
- 동아시아 저어새 보전운동 과거 10년 미래 10년
- 동아일보
- 동양란길잡이
- 동인지 잡지로 보는 제주 문단의 흐름
- 되돌아본 세월
- 두레 농민의 역사
- 두산백과사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라
-
마
- 마을의 미 제주도
- 마을의 형성과 변천
- 만불신문
- 만언사 이본연구
- 맛있는 물의 조건
- 매계선생문집
- 매스컴대사전
- 매일신보
- 명월향토지
- 목숨보다 더 깊은 사랑... 애달픈 碑만 남았구나
- 목재민속품연구
- 몰래물 향토지
- 몽원과 제주마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 무속자료사전
- 문연서당 터
- 문화 영웅으로서의 제주 여신들
- 문화방송30년 연표
-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곽지리 금성리
- 문화유적 분포지도
-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곽지리 금성리
- 문화제주
- 물고기백과
-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 제주도와 류쿠열도의 교류
- 미술사방법론
- 미술의 해석
- 미술평단
- 미학사전
- 민구
- 민란의 시대
-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사업실적보고
- 민선자치군정 11년
- 민선자치군정 11년사
- 민속놀이
- 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20년사
- 민요론집
- 민족생활어사전
- 민족의 영산 한라산
- 민주노총제주본부 제13차대의원대회
-
바
- 바다 건넌 조선인 해녀
- 바다 넘는 제주도의 해녀
-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 바다밭 이야기
- 바다와 산이 있어 아름다운 그곳 제주도
- 바람섬의 울림
-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 박물관 도록 서화류
- 박물관 소장 고문서 해제 -안민고 절목-
- 박종실의 약력
-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 방선문
-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 백록어문
- 백조일손지지의 한을 넘어서
- 벅수와 장승
- 번암집
- 범선 항해시대의 제경해로
- 범증산교사
- 벚꽃이 펄펄 쏟아지는 길
- 변방인의 세계
- 보건 환경 연구원보
- 보호대상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연구
- 봅서예 D
- 봉남비서
- 봉남선사와 유불선삼법
- 봉성문여
- 부산 금석문
- 부해문집
- 북제 주교육 50년사
- 북제주 교육 50년사
- 북제주 교육사
- 북제주교육 50년사
- 북제주군
- 북제주군 문화유적
-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 북제주군 민요 채보 연구
- 북제주군 반세기
- 북제주군 비석총람
- 북제주군 비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
- 북제주군 지명총람
- 북제주군 철새도래지의 조류보호방안
- 북제주군의 문화 유적
- 북제주군의 문화 유적 분포 지도
-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 북제주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
- 북제주군지
- 북제주지의 역사
- 북주주군지
- 북촌리유적
- 불교
- 불교 조각
- 불교 조각 1
- 불꽃의 여인 강평국
- 브로켄
- 비
- 비바리어고
- 비양도 학술조사보고서
- 빌레못 동굴 학술 조사 보고서
-
사
- 사법연감 2006
- 사수도 슴새의 번식밀도
-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 사업보고
- 사진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지형학
- 사진으로 보는 제주 목축 문화
- 사진으로 보는 제주YMCA 50년의 발자취
- 사진자료집
- 사회
- 산굼부리의 식물
- 산업 사회의 무당
- 산지천예술마당 상권 활성화 기여
- 산지천의 물과 생태
- 산천단의 솔바람 소리
- 살아남은 자의 기록
- 삶과 문화
- 삼국사기
- 삼법성전
- 삼법수도진리
-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 삼별초와 제주도
- 삼별초의 난
- 삼별초의 항쟁
-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 삼양동지
-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 상례비요
- 상모리 유적
- 상모리유적
- 상황의 질곡을 비상하는 자유의 항해 대담
- 새 주소 낯선데 또 도로 이름 바꾼다고
- 새로 쓰는 제주사
- 생명의 원류 하천과 계곡
- 생명의 젖줄 우리시의 용천수
- 생업기술 어로기술과 어로구
- 생활문화와 옛문서
- 생활상태조사
- 서귀포산 자리돔의 어획개선 및 적정이용을 위한 자원생물학적 연구
- 서귀포시의 전승 민요
- 서울신문
- 석불·마애불
- 선문대할망 설화고
- 선원총람
- 선조실록
- 선흘 벵뒤굴 학술 조사 보고서
-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 성산 표선간 국도 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내 유적발굴조사보고서
- 성읍리유적
- 성주
- 성주이씨세적
- 성찰과 지향 제주작가회의 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세계 자연 유산 해설 표준 교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 세계 환경 수도 추진 본부 녹지 환경과 보도 자료
- 세계미술용어사전
- 세시풍속
- 세조실록
- 세종갤러리 뒤돌아본 14년
- 세종실록
- 세종실록지리지
- 소방 대응 행정 자료 및 통계
- 속음청사
- 속탐라록
- 수눌음
- 수도권 지역 제주특산물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분석
- 수은문집
- 수은시집
- 수정사 원당사 지표조사보고
- 수형인명부
- 숙종실록
- 순조실록
- 시대와 삶
- 시정백서
- 식물과 천연기념물 제주도의 민속과 자연
- 신광
- 신들의 고향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축제주항쟁자료집
- 신화와 전설
- 신화학원론
- 신화학입문
- 실내수조에서 사육한 참조기 배발생 및 자치어의 형태
-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 심재 김석익
-
아
- 아라 종합 사회 복지관
- 아라리오 뮤지엄 등 전시 특화...기발난 현대 미술의 섬, 제주
- 아름다운 생태이야기
-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 아름다운 제주정신
- 아이들아 아이들아
- 안익태 선생과 탐라합창단
- 암소와 황소
- 애월읍-제주대 애조로 직통 시외버스 770번 신설
- 앵글 속 지리학(하)
- 약마희고 영등굿에서의 경조민속
- 양식산 자주복의 인공 수정란 생산
- 양악계선선사의 비
- 어구
- 어로기술과 어로구
- 언론노보
- 업무 보고 자료
- 업무보고자료
- 여걸 김시숙의 생애
- 역사 속에 나타난 조선시대 제주의 여성
- 역사재현에 있어서 영상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 역주 증보 탐라지
- 역주 탐라지
- 역주증보탐라지
- 역해 향토 문화 교육 자료(譯解 鄕土文化敎育資料集)
- 연극에 대한 추억과 변명
- 연담유일선사의 비
- 연산군일기
- 연삼로 구간 완전 개통!
- 연지
- 연합뉴스
- 열린 제주시
- 영주십경시집
- 영주어문
- 영주일보
- 영주지에 대한 고찰
- 영주풍아
- 영평마을
- 영화
- 예고
- 옛 영화는 간데없고 근·현대사 아픔의 흔적만
- 오름길라잡이
- 오름나그네
- 오정민은 누구인가
- 온평리지
- 완당평전
- 왜구의 침입과 방어시설
- 외도동 향토지
- 용담동 먹돌로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용담동 용문로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용담동 유적-제주도 탐라 형성기의 마을 모습
- 용담동고분
- 용담동지
- 용방록
- 용암수 융합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보고서
- 우당 도서관, 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다채'
- 우도 학술조사보고서
- 우도의 지형과 지질
- 우도지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 우리가 알아야 할 새 백가지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무 백가지
- 우리고장의 민속놀이
- 우리고장의 여름 향토음식 제주도 자리회 해삼토렴회 돼지새끼회
- 우리나라 민속놀이
- 우리나라 찌르개 연구
- 우리나라식물명감
- 우리문화이야기
- 우리새소리 100가지
- 우리옷이천년
- 원
- 원 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 연구
- 원 명교체기의 제주도
- 원대의 제주마 목장
- 원불교학개론
- 원색대한식물도감
- 원색한국수목도감
- 원색한국식물도감
- 원색한국어류도감
- 월간 제주
- 월간제주
- 월정리
- 유도제주
- 유람선 관광지로의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
- 유배가사 연구
- 유한라산기
- 읍지
- 읍지제주도 우도의 홍조단괴 해빈 퇴적물의 특징
- 응와전집
- 응운우능선사순공지탑
-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 조사 연구 보고서
- 의회보
- 이것이 개벽이다
- 이당 회고록
- 이세진의 제주 불교 혁신 운동 연구
- 이야기여성사
- 이어도로 간 비바리
- 이여도를 찾아서
- 이여탄어민지
- 이완희 선생 기증 유물 특별전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 인공어초 사후관리조사보고
- 인공어초 시설실적
- 인구·교통량 ‘부쩍’...치안 대응 ‘버겁다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찾아서
- 일도 2동지
- 일도2동지
-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민속학적 고찰
- 일본 야만인 전통의 연구
-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 일제 말기 제주도와 일본군 전쟁 유적지
- 일제 하 제주도 학교 설립 운동
-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 일제하 제주 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과 제주 야체이카 사건
- 일제하 제주 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 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 일제하 제주도 학교 설립 운동
-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야체이카 사건
-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 잊혀져 가는 문화 유적
- 잊혀져 가는 문화유적
-
자
- 자산어보
-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 자연지리학사전
- 자연환경과 인간
- 재일 제주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 재일조선인사연표
- 재해백서
- 쟁의특보
- 저어새
- 저어새 월동지인 성산포와 하도리의 서식환경 및 보호방안
- 저어새의 도래현황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어새의 지속적인 서식을 위한 서식실태조사와 서식지 환경특성 분석
- 전국 국제스포츠대회 추진 계획
- 전국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 전라남도의 정기시 구조와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지
- 전문가리포트 1백여 오름에 갱도진지 구축
- 전시회 도록
- 전은자의 제주 바다를 건넌 예술가들⑫ 유배지 스승 찾아 제주 바다를 건너다 소치 허련(小癡 許鍊)
- 전통 사찰 총서
- 전통문화의 뿌리
- 전통사찰총서
- 젊은이를 위한 제주민요
- 정구용판결문
- 정기총회 자료
- 정려비에 나타난 제주인의 효행연구
- 정밀토양도
- 정신 건강론
- 정신문화연구
- 정조실록
- 정책세미나 자료
-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 제14호 태풍 매미 보고서
- 제15회 전시회도록
-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를 마치고
-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 제1회 제주학생종합예술제
- 제3기 제주시 지역 사회 복지 계획(2015~2018)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사회 복지 계획
-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요강
- 제58군배비개견도
- 제5장 해전과 해양사
-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최종 보고서
- 제83회 전국체전 백서
-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
- 제남신문
- 제농 80년사
- 제동목장자료
- 제민일보
- 제민일보소식지
- 제주 100년
-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 제주 4·3 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 제주 4·3 유적
- 제주 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 제주 4·3의 전개 과정과 미군정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 60대 사건 태풍 사라 제주 강타
- 제주 ‘조설대’에 서린 항일정신 잇는다
- 제주 걷기 여행
-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 제주 공항로 가로수 ‘후박나무’로 새 단장
- 제주 관광 반세기
- 제주 관광메뉴얼
- 제주 교육 행정사
- 제주 교육사
- 제주 교통사 소고
- 제주 국제 자유 도시기본계획
- 제주 국제 자유 도시보완계획안
- 제주 국제 자유 도시종합계획 2002~2011
- 제주 김녕리 유적
- 제주 대학교 병원
- 제주 돌 바람 그 문화와 자연
- 제주 동명리 유적
- 제주 동부 보건소, ‘행복하려면 건강합시다’ 캠페인 전개
- 제주 문화 상징
- 제주 문화 예술 현황
- 제주 백아도 진남포 지질도폭 설명서
- 제주 별빛누리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 북촌리 유적
- 제주 불교 문화재 자료집
- 제주 사법사
- 제주 사회 복지 발자취
- 제주 사회 복지 협의회 25년사
- 제주 상의 60년사
- 제주 서사무가에 나타난 어휘 형성 연구
- 제주 섬 한바퀴 도는 환상 자전거 도로 올해 뚫린다
- 제주 성읍 마을
- 제주 성읍리유적
- 제주 소방 행정사
-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 제주 애월 체육 센터 게이트볼장 준공...'생활 체육의 기회 확대'
- 제주 애월도폭 지질보고서
- 제주 언론사
- 제주 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 제주 여성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 제주 여성의 삶과 공간탐구
- 제주 역사 기행
- 제주 오현 조사
- 제주 올레-제주시 가이드북
- 제주 용담동 월성로 유적
- 제주 용담동 유적
- 제주 용암 해수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보고서
- 제주 유배 문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사업 보고서
- 제주 유배가사 연구
- 제주 유배문학 연구
- 제주 인명 사전
- 제주 자연 생태가 함께 숨쉬는 '사려니 숲길'
- 제주 자치 경찰 관광 환경 업무 특화
- 제주 재래가축 편람
- 제주 전승동요
- 제주 전통음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 제주 전통혼례와 음식문화에 관한 민속지적 묘사
- 제주 젓갈의 내력과 요리
- 제주 조랑말
- 제주 조천 체육관, 4억 특별 교부세 지원
- 제주 종달리유적
- 제주 지역 목장사와 목축 문화
- 제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 학술 세미나
-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 제주 토종돼지의 사육과 식문화
- 제주 하원동 분묘군
- 제주 항일 독립운동사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 계획
- 제주 해녀 항일 투쟁 실록
-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 제주 향토 문화 사전
- 제주 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제55호] 고시
- 제주 흑우 천연기념물 제546호 지정!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제주4·3사건자료집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제주4·3유적
-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 정관
- 제주감귤농협 40년사
- 제주감귤도감
- 제주건축의 맥
-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
- 제주계록
- 제주고내리유적발굴조사개보
- 제주고산리유적
- 제주고산향토지
- 제주고씨족보
- 제주곽지패총
- 제주관광가이드
- 제주교안 이후 제주지역 천주교회의 동향
- 제주교육사
- 제주교육소식
- 제주교육행정사
- 제주교통사소고
- 제주국제공항착륙부지내 확장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
- 제주규제자유지역의 추진 여건과 실현방안
- 제주근해산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의 연령과 성장에 관한 연구
- 제주금성리유적
- 제주기협회보
- 제주노회사
- 제주농요
- 제주대정정의읍지
-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
-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
- 제주도
- 제주도 50년사
-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 제주도 가족과 궨당
-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 제주도 고고학 연구
- 제주도 고고학의 재조명
- 제주도 곤충
- 제주도 곤충상
- 제주도 구석기 유적 부존 가능성
- 제주도 구석기문화의 재검토
- 제주도 구석기유적 부존가능성
-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 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
-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관찰
-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 제주도 기독교 개신교 시군읍면별 교회 분포 현황
- 제주도 기후특성집
- 제주도 김녕-월정 해안 사구 지역의 환경 변화 연구
- 제주도 노동요 연구
- 제주도 당굿과 경제
- 제주도 당신앙 연구
- 제주도 도감의례
- 제주도 동굴유적의 성격
- 제주도 동부지역 지하분포 화산암류의 40Ar-39Ar 연대와 화산활동 해석
- 제주도 마애명
-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Ⅰ
- 제주도 목장사
- 제주도 목재민속품
-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
- 제주도 무문 토기문화의 연구현황과 과제
- 제주도 무문토기문화의 연구현황과 과제
-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 제주도 무속논고
- 제주도 무속신화
- 제주도 무속연구
-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 제주도 무의의 기메고
- 제주도 무형문화재 음악연구
-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 제주도 무혼굿
- 제주도 문제의 유래
- 제주도 문화 스포츠 교통 현황
- 제주도 물장오리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보고서
- 제주도 민간 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 제주도 민간요법
- 제주도 민담
- 제주도 민속
- 제주도 민속음악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조사보고서
- 제주도 민요연구
-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
- 제주도 바다와 산이 있어 아름다운 그곳
-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 제주도 방언집
-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사회복지단체편람
- 제주도 상 장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의 교육적 의미 연구
- 제주도 상 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 제주도 서검은오름의 양치식물상
- 제주도 석재민속품
-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의 월동 행동 및 생태
- 제주도 성산포에 도래하는 저어새의 월동생태 및 관리방안
- 제주도 세시풍속
- 제주도 소금밭
- 제주도 속담사전
-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보고서
- 제주도 수자원개발사
- 제주도 수필
- 제주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 제주도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
- 제주도 신석기 시대 토기 변천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신석기 시대 토기의 형식과 시기 구분
-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 변천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의 형식과 시기구분
- 제주도 신화
- 제주도 신화와 전설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 제주도 신화전설
- 제주도 여말 선초 분묘 연구
-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구의 현황과 전망 고고학적 측면
- 제주도 연극협회
- 제주도 연근해 연속식채낚기어구의 생력화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안의 수온 염분 변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연안의 해황특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 제주도 우도의 홍조 단괴 해빈 퇴적물의 특징과 형성 조건·예비 연구 결과
- 제주도 유적
- 제주도 유치원 교육의 발전과정 조사 연구 및 실태
- 제주도 음식문화
- 제주도 의사회 60년사
- 제주도 일반 동산 문화재
-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재
-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재 조사보고서
- 제주도 일본군 진지 동굴 전쟁 유적 조사 보고서
- 제주도 일본군 진지 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 제주도 자료집
- 제주도 잠수굿 연구
- 제주도 장례의식요
- 제주도 적갈색 경질 토기 연구
-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 연구
- 제주도 전래농기구
- 제주도 전설
- 제주도 전설지
- 제주도 전적종합조사보고
-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 제주도 제주마
- 제주도 조류연구사에 관한 고찰
- 제주도 조류의 개관
- 제주도 조면암류의 지화학적 특징
- 제주도 조상본풀이 연구
-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 제주도 주변 무인도의 조류상
- 제주도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조류현황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죽재민속품
-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자료집
- 제주도 지석묘 조사 연구
- 제주도 지석묘 조사보고
- 제주도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
- 제주도 지질 공원 신청서
- 제주도 지질 여행
- 제주도 지질여행
- 제주도 지하수 이용 및 관리연혁
-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
- 제주도 천연 동굴 일제 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천연 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천연동굴 내 문화유적 기초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 제주도 철재민속품
- 제주도 체육사
- 제주도 체육회 50년사
- 제주도 초재민속품연구
- 제주도 최초 근대 여학교 신성 여학교 연구
- 제주도 추는굿
- 제주도 출토 한대 화폐유물의 한 예
- 제주도 큰굿자료
- 제주도 통속음악
- 제주도 포구연구
- 제주도 하천의 특성과 보전 방향 환경의 날 하천토론자료
- 제주도 함덕연안 각망어업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제주도 해안 육조류의 군집구조에 관한 분석
- 제주도 해안 지역의 경관적 특성
- 제주도 해안 지역의 자연환경
- 제주도 해안습지 조사보고서
- 제주도 해안을 가다
- 제주도 해안지역의 자연환경
- 제주도 해양수산현황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집단 요구 표출 활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곤충
- 제주도내 풍력자원 조사에 관한 연구 용역
- 제주도류인전(濟州島流人傳
- 제주도립도서관약사
- 제주도립예술단사
- 제주도마애명
- 제주도목장사
- 제주도무가
- 제주도민속자료
-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 호상옷과 상복
- 제주도방언연구
- 제주도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 제주도부락지
- 제주도사 논고
- 제주도세요람
- 제주도속담연구
- 제주도수필집
- 제주도신축년교난사
- 제주도실기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 동굴 및 진지 현황과 구조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 동굴의 구조적 유형과 병력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구조적 유형과 병력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현황과 구조
-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의 구조적 유형과 병력
- 제주도에 도래하는 월동조류의 현황
-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
-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흑로의 산란수 알의 크기 번식주기
- 제주도에서 팔색조의 분포와 서식환경
-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 결전 준비
- 제주도에서의 흑로의 번식지와 영소습성
- 제주도연구
- 제주도연안 멸치초망어업의 조업생력화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제주도요지 조사보고
- 제주도유인전
- 제주도유적
- 제주도음식
- 제주도음식문화
- 제주도의 1인가족 연구
- 제주도의 3걸인 중 1인 강창보 선생 투쟁사
- 제주도의 경제
- 제주도의 공물진헌에 대한 고찰
- 제주도의 굿춤
- 제주도의 기층문화
- 제주도의 기후적 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제주도의 농기구
- 제주도의 무속음악
- 제주도의 무속의례
- 제주도의 문화유산
- 제주도의 방사용 탑
- 제주도의 사후혼연구
- 제주도의 상제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 제주도의 식생활
- 제주도의 염전과 소금 생산방식
- 제주도의 영등굿
- 제주도의 오름과 보전
- 제주도의 유식 부락제
- 제주도의 의료
-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 제주도의 전통문화
- 제주도의 지형과 지질
- 제주도의 천연 동굴
- 제주도의 천연동굴
- 제주도의 천주교
- 제주도의 친족조직
- 제주도의 토양과 농업자원 제주도 토양의 분류와 특성 및 관리 문제
- 제주도의 통혼권
- 제주도의 해안 지형과 보전
- 제주도의회사
- 제주도적십자50년사
- 제주도전래농기구
- 제주도전설
- 제주도전설지
- 제주도정
- 제주도지
- 제주도체육사
- 제주도체육회 50년사
- 제주도포구연구
- 제주도학
- 제주도해녀
- 제주동명리유적
- 제주마의 보존 및 활용 심포지움
- 제주마의 역사 생산 및 활용방안 제2회 제주마 축제기념 학술세미나자료
- 제주만화작가회전 창립 팜플렛
- 제주만화작가회전 팜플렛
- 제주말고기 음식문화와 영양기능성
- 제주메밀의 내력과 영양
- 제주목관아지
- 제주목지지총람
- 제주무속학사전
- 제주무인도 학술조사
- 제주문단사
- 제주문예연감
- 제주문학
- 제주문화
- 제주문화론
- 제주문화방송삼십년사
- 제주문화예술
- 제주문화예술백서
- 제주문화예술현황
- 제주문화유산 들여다보기
- 제주문화자료총서
- 제주문화재연구
- 제주미술
- 제주미술인작품집
- 제주미협 40년사
- 제주민속유적
- 제주민속의 멋
-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 제주민속주의 이해
- 제주민예총
- 제주민요
- 제주민요 기능과 사설의 현장론적 연구
- 제주민요의 기능과 사설의 현장론적 연구
-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 제주민요의 이해
- 제주민의 삶과 문화
- 제주민의 항쟁
- 제주바다
- 제주바다의 채소 톨 톳의 영양과 실용조리
- 제주반세기
- 제주발전포럼21
- 제주방송사
- 제주방언 문법연구
- 제주방언 형태변화 연구
- 제주방언연구
-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 제주병제봉대총록
- 제주부령사요람
- 제주불교
- 제주불교총서
- 제주사 연표
- 제주사 인명 사전(濟州史人名事典
- 제주사 인명 사전(濟州史人名事典)
- 제주사법사
- 제주사인명사전
- 제주사자료총서
- 제주삼다수와 국내외 먹는샘물 수질 비교
- 제주삼양동유적
- 제주삼읍도총지도
- 제주삼읍전도
- 제주상공회의소 설립관계
- 제주상의 50년사
- 제주상의 60년사
- 제주상의 65년사
- 제주선교 70년사
- 제주선현지
- 제주설화집성
- 제주소리꾼
- 제주속담사전
- 제주속담총론
- 제주속오군적부
- 제주수산60년사 1946-2006
- 제주순무어사서계
- 제주습지
- 제주시
- 제주시 50년사
- 제주시 가정의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제주시 교육 50년
- 제주시 교육사
- 제주시 교통 변화의 50년
- 제주시 도로·광장·공원 237곳에 특성 살린 명·별칭 부여
- 제주시 도시계획 40년사
-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및 주변재래시장 경영혁신 연구
- 제주시 동지역 새주소(로급) 도로 구간 및 도로명 조서
-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연구
- 제주시 문화유적
- 제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제주시 비석일람
- 제주시 비지정 고인돌 및 암각화 실태조사
- 제주시 삼대 하천의 생태계 학술조사보고서
- 제주시 수협사
- 제주시 신산 공원 성화 도착 기념 조형물 공정 65% 진척
- 제주시 애월 체육 센터, 어르신 아쿠아로빅 교실 운영
- 제주시 애월 체육 센터·외도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 추진
- 제주시 옛지명
- 제주시 오십년용사담
- 제주시 외도동유적
- 제주시 외도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시 원도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제주시 인구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 제주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제주시 통계연보
-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제주시 한경 해안 도로 ‘성 김대건 해안로’ 명명
- 제주시, 애월 수영장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 제주시, 애조로 포장면 보수 공사 완료
- 제주시교육 50년
- 제주시군개발계획
- 제주시에 ‘만덕로’등장
- 제주시용담동 유적
- 제주시의 공원
- 제주시의 문화유적
- 제주시의 방어유적
- 제주시의 비석일람
- 제주시의 옛터
- 제주시의 종교
- 제주시정
- 제주시지
- 제주신문
- 제주신문오십년사
- 제주신보
- 제주실록
- 제주어 비바리 어휘에 대하여
- 제주어 사전
- 제주언론사
- 제주언론인
- 제주에 ‘별 볼일 생겼다’
- 제주여고 50년사
- 제주여성문화
- 제주여성전승문화
- 제주여인상
- 제주역사기행
- 제주역사문화관광 가이드북
- 제주예술
- 제주예술문화현황
- 제주옹기
- 제주옹기공예
- 제주와 오키나와
- 제주우정100년사
- 제주유맥 육백년사
- 제주음악의 개척자 김국배
- 제주음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제주읍지
- 제주의 가례
- 제주의 관문 공항로 13억원 들여 말끔히 정비
- 제주의 기록문화
- 제주의 돌문화
- 제주의 마을
- 제주의 마을시리즈
- 제주의 명수 이용과 보전방안
- 제주의 명절과 음식문화
- 제주의 명절음식과 음식문화
- 제주의 무속
- 제주의 무속 신앙과 신종교
- 제주의 문화재
- 제주의 문화재 안내문안집
- 제주의 물 용천수
- 제주의 물 용천수 제주도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 제주의 민속
- 제주의 민요
- 제주의 바다
- 제주의 방어유적
- 제주의 불적
- 제주의 비
- 제주의 비(碑)
-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 제주의 상권 관덕로 ①
- 제주의 상권 관덕로②
- 제주의 상권 남성로 ③
- 제주의 상권 남성로 ④
- 제주의 상권 동광로 ①
- 제주의 상권 동광로 ③
- 제주의 상권 시리즈
- 제주의 상권 탑동로 ①
- 제주의 상권 탑동로 ②
- 제주의 서당 교육
- 제주의 선사유적
- 제주의 성곽
- 제주의 소리
- 제주의 술
- 제주의 언어
- 제주의 역사와 문화
- 제주의 옛 지도
- 제주의 오름
- 제주의 인맥
- 제주의 전통문화
- 제주의 전통음식
- 제주의 지하수
- 제주의 천연염색
- 제주의 폐사지
- 제주의 해녀
- 제주의 해안습지
- 제주의 핵심 삼도2동
- 제주의 향토민요
- 제주의 허파 곶자왈
- 제주의소리 창간1주년기념 자료집
- 제주인
- 제주인명록
- 제주인의 3·1 운동과 그 영향
-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 제주인의 삶과 돌
- 제주인의 심성을 닮은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 제주인의 항일 운동
- 제주인의 항일운동
- 제주일보
- 제주일보 60년사
- 제주자생 상록수도감
- 제주재래감귤의 분류와 유용형질
- 제주저널
- 제주전기 77년 제주도 전력사
- 제주전설집성
- 제주전통두부 둠비의 역사와 두부요리
- 제주전통음식
- 제주전통음식의 이해
- 제주전통주거에서의 여성공간
- 제주주 김녕-월정 사구의 발달 과정에 관하여
- 제주지방 50년사
- 제주지방 과거와 현재
- 제주지방의 기상관측 역사와 기후 변동성 연구
- 제주지역 가창유희요 고찰
- 제주지역 재래돼지의 특성과 활용현황
- 제주지역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 제주지역어의 음운론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뉴스레터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소식
- 제주참언론소식
- 제주천주교회 100년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개발사업고시
- 제주청년
- 제주체육
- 제주체육 비전 2000
- 제주춤 무보집
- 제주충효열지
- 제주타임스
- 제주태권도 50년사
- 제주토속주 조사연구
- 제주토속지명사전
- 제주통계연보
- 제주통사
- 제주투데이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생체육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시설 단체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경기단체 등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보고서
- 제주판화가협회 전시도록
- 제주풍토록
- 제주하모리유적
- 제주하원리호적중초
-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제주합창의 발자취
- 제주항일독립운동사
- 제주항일인사실기
- 제주해녀사 재조명
- 제주향교지
- 제주향토음식론
- 제주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
- 제주현대문학사
- 제주형 스포츠 발전 모델
- 제주화보
- 조기유자망 조업시스템 개량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조명과 조명구
- 조사연구보고서
- 조선 시대 전기
- 조선 시대 제주도의 군현 구조와 지배 체제
- 조선 중기 제주 유민의 발생과 대책
- 조선 후기 제주 지역의 수취 체제와 주민의 경제 생활
- 조선 후기 제주 환곡제의 군영 실상
- 조선군개요사
- 조선불교
- 조선불교혁신전도승려대회 회의록
- 조선비망록
- 조선사회운동사사전
- 조선상식
- 조선시기 제주 신인 기사 검토
- 조선시대 전기
-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관계 연구
- 조선시대 제주도의 군현구조와 지배체제
- 조선시대 제주마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 조선시대 제주마 관설목장의 관계 연구
- 조선시대 후기
- 조선왕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 조선왕조실록의 서화자료
- 조선인명사전
- 조선일보
- 조선전기 관방시설의 정비과정
- 조선전기 성곽기능고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
- 조선환여승람
-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 조선후기 제주 환곡제의 군영실상
- 조선후기 제주비방의 군사제도
-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 조설대에 새긴 애국지사의 구국 정신 계승
- 조천 농협, 제5회 원로 조합원 게이트볼 대회 개최
- 조천 도서관 '인터넷보다 독서삼매경' IT 나눔 운동으로 선정
- 조천읍지
- 종교계의 항일 운동
- 종달리 유적
-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운영 방안
- 주민 자치 센터 프로그램 개발
- 주요 관광 행정 현황
- 주요 행정총람
- 주요업무보고
- 죽음의 예비검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배분
- 중약대사전
- 중종실록
- 증보 제주 통사
- 증보 제주통사
- 증보 탐라지
- 증보본초비요
- 증보탐라지
- 지리사전
-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
- 지방 자치와 지방 정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지방과학기술연감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 지방행정구역요람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지역 사회 복지 실천 현장의 이론과 사례
- 지역혁신사업안내
- 지영록
- 지질학 개론
- 지형학
- 진중신문
- 집쥐에 의한 슴새 번식성공률 감소
- 짚 풀공예
-
차
- 찬물교 연구 서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평가와 과제
- 참조기 조미건포류의 이화학적 특성
- 창립 30주년 사진집
- 창립10주년 기념 사진작품집
- 창립전시회 도록
- 천기대요
- 천연 바닷물 수영장 애월 국민 체육 센터,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 천연기념물
- 천연기념물의 식물상 문화관광 해설사교육
- 천제연계곡의 식물상 연구
- 천주교
- 청암선생
- 체육 스포츠사 연구
- 초가
-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도래한 월동 수조류 조사
- 추사와 그의 시대
- 추자도
-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 추자도 학술조사보고서
- 추자도의 조류상
- 추자도지
- 추자마을 사랑지도 자혜집
- 출입국·외국인 통계 월보
- 충암집
- 취락을 통해서 본 탐라의 성립과 전개
- 취락지리학
- 칠성로 공사 구간서 옛 우물. 철기 시대 유물 확인
-
타
- 탐라 성주 고봉례 묘 추정지-제주시 화북동 분묘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 탐라 이전의 사회와 탐라국의 형성
- 탐라 인물고
- 탐라계록의 이두문과 이두 해독
- 탐라국 입춘굿놀이
- 탐라국사료집
- 탐라기년
- 탐라록
- 탐라명감
- 탐라문헌집
- 탐라문화
- 탐라방영총람
- 탐라사료문헌집
- 탐라사자료집록
- 탐라성립기 취락의 형성과 변천
- 탐라성주고봉례묘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보고서
- 탐라순력도
-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 탐라순력도연구논총
- 탐라어연구
- 탐라의 명칭과 대외 관계
- 탐라의 효자 열녀전
- 탐라입춘굿놀이
- 탐라지
- 탐라지 초본(상)
- 탐라지 초본(하)
- 탐라지초본
- 탐영방영총람
- 태종실록
- 태평양 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 시설
- 태평양 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 태풍백서
- 토정비결
- 통계연보
- 통과의례 속의 제주여성 풍속 전승 양상
- 통시문화고 제주도 서민문화의 일단면
- 통일법요집
- 특별 자치 마을 만들기팀 보도 자료
- 특별자치도 출범 그 간의 성과와 과제
-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향후 전망
- 파
-
하
- 하늘빛으로 물든 새
- 하도 마을 종합 발전 계획
- 하도 향토지
- 하도리의 생업민속
- 하도향토지
- 하멜표류기
- 하모리유적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관리
- 학명비음기
- 한국 고고학 전문 사전
- 한국 고전 문학과 세계 인식
- 한국 민속 신앙 사전: 무속 신앙 편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 한국 신문 백년
- 한국 신문사
- 한국 신문사 연구
- 한국 신종교 실태 조사보고서
- 한국 언론사
- 한국 연근해 갈치 Trichiurus lepturus Linnaeus의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
- 한국 연근해 갈치 Trichiurus lepturus의 분포와 회유
- 한국 연안산 검복과 자주복의 독성
- 한국 오페라에서 동굴음악까지 낙관심
- 한국 장수도 변화의 공간적 특성
- 한국 전쟁과 불교 문화재
- 한국 전쟁사
- 한국 전쟁의 포로
- 한국 지석묘 고인돌유적 종합조사 연구
- 한국 철도 차량 100년사
- 한국 최초의 어보 우해이어보
- 한국 해양문학 연구
- 한국 현대언론사론
- 한국고고학사전
-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한국고문서연구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 한국구비문학대계
- 한국기독교 역대인물
- 한국기독교 인물 탐구
- 한국기후표
- 한국농작물백과도감
- 한국동식물도감
- 한국마정사
-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 한국민간설화집
- 한국민속대사전
-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식생활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한국민요대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 한국민족종교총람
- 한국방송사
- 한국방송육십년사
- 한국방송칠십년사
- 한국복식2천년
- 한국복식사연구
- 한국불교인명사전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 한국산 참복과 복어목 어류의 계통분류학적 연구
- 한국산 참복아목 어류
- 한국서점편람
- 한국세시풍속사전
- 한국수목도감
- 한국수산지
- 한국수수께끼사전
- 한국식물검색집
- 한국식물명고
-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아나키즘운동사
- 한국어구도감
- 한국어도보
- 한국원예식물도감
- 한국은행 제주지점 25년사
- 한국의 고문서
- 한국의 금기어 길조어
- 한국의 기상재해조사
- 한국의 기후
- 한국의 난초
- 한국의 농요
- 한국의 미
- 한국의 민가연구
- 한국의 보약
- 한국의 사찰문화재
- 한국의 살림집
- 한국의 신화
- 한국의 옛집
- 한국의 장시
- 한국의 전설
- 한국의 전통공예
- 한국의 종교
- 한국의 지질 유산
- 한국의 해녀
- 한국의 해양문화
- 한국인명대사전
-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 한국전쟁기 제주 문단과 문학
-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 한국전쟁기의 제주문단과 문학
- 한국전통복식문화연구
- 한국조류생태도감
- 한국종교문화의 현황과 특징
- 한국지리지
- 한국지명요람
- 한국지명총람
- 한국지지
- 한국케이블TV5년
- 한국하천 일람
- 한남 서성로간 도로확 포장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한라병원보
- 한라봉 감귤 저온저장의 경제성 분석
- 한라산
- 한라산 관음사 4·3위령제 봉행 자료
- 한라산 남사면의 조류 군집 구조에 관한 연구
- 한라산 산림조류의 군집에 관한 연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 한라산과 지명
-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 연구
-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보고서
- 한라산내 5개 지역의 포유류상
- 한라산에서 팔색조의 분포와 번식 생태
- 한라산의 구비전승 지명 풍수
- 한라산의 동물
- 한라산의 식물
- 한라산의 인문지리
- 한라산의 지명
- 한라산의 천연기념물 조류 조사
- 한라산의 하천
- 한라산이야기
- 한라수목원 식물목록
- 한라연감
- 한라일보
- 한라일보 노보
- 한라일보뉴스
- 한말 일본의 제주 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 한시속의 새 그림 속의 새
- 한올레
- 한중일 국제 환경사진 문화교류전 도록
- 한중일 삼국 신종교실태의 비교연구
- 한천 주변의 상고 문화의 형성과 전개
- 한천주변의 상고문화의 형성과 전개
- 합천 봉계리유적
- 항일 순국한 신앙인 조봉호 국난극복인물
- 해녀 노젓는 노래의 현장론적 연구
- 해녀항쟁독립유공자 부춘화 김옥련
- 해륜사지
- 해방 직후의 제주 문학
- 해양군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 해양군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행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정책
- 향토민요와 문화
- 향토사 교육 자료
- 향토사교육자료
- 향토요리교재
- 향토지
- 헌법학 개론
- 현대 신종교의 이해
-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 현대한국어구도감
- 현황 자료
- 협재 동굴 지대 학술 조사 보고서
- 형사사건부
- 홍정표 선생
- 홍화각기
- 화가 강태석의 삶과 예술
- 화북 조천 비석거리 신음 비문 없어지고 표면 크게 변형
- 화북동향토지
- 화북포구지표조사보고서
- 화산
- 화산섬 돌 이야기
- 화산섬, 제주 문화재 탐방
-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
- 화산이 빚은 제주도 지질 공원
- 환경 보전국 산림 휴양 정책과 보도 자료
- 환경백서
- 환경스페셜
- 환성당지안대종사행장
- 환해장성연구
- 회명문집
- 회칙 발기취지문
- 효열록
- 효전 심노숭 문학연구
- 흑오미자 자생 임분의 입지환경과 식생구조
- 흥미계
-
가
| 항목 ID | GC00702544 |
|---|---|
| 한자 | 國土-象徵漢拏山天然保護區域 |
| 영어의미역 | The Highesh Mountain of South Korea |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집필자 | 강문규 |
[개설]
한라산[1,950m]은 남한 최고봉으로 백두산과 더불어 국토를 잇는 상징적인 산이다.
한라산은 예부터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으로 백록을 탄 신선이 사는 영산이라 알려져 왔고, 불로초를 찾아 영주산을 찾았다는 서불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또한 한라산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솥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제주인의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의 보고이다.
또한 한라산은 세계 최대의 기생 화산을 거느린 산으로 360여 개의 자화산을 거느리고 있다. 그 기슭에는 2,000종에 이르는 한대·온대·아열대 식물과 3,000여 종의 곤충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질·생태·경관적 가치로 인해 2003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존 핵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이기도 하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천연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사라져버린 한라산 최고봉, 혈망봉]
흔히 백록담이 한라산의 최고봉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백록담은 한라산의 최고봉이 아니다. 천지(天池)가 백두산의 최고 지점이 아니듯이 백록담도 그렇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백록담을 한라산 정상인 것처럼 표현한다. 이는 정상을 일컫는 마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한라산에는 최고봉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일까. 우선 지형적으로 볼 때 한라산 정상이라고 딱히 부를 만한 높은 봉우리가 없다. 한라산은 부악(釜岳) 또는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부른다. 정상부가 마치 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두무악 역시 머리가 없는 산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이는 한라산 정상부의 형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백록담을 둘러싸고 있는 분화구 외륜부는 성곽처럼 보이는데, 동서면은 높고 남북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남서 사면이 가장 높지만 얼핏 보면 솥처럼 기복이 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라고 하기가 애매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한라산 정상을 말할 때 흔히 ‘상봉(上峰)’ 또는 ‘절정(絶頂)’이라고 섞어 불렀다.
최초의 한라산 등반기를 남긴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는 “절정(絶頂)에 도달하였다. 구덩이같이 함몰되어 못(백록담)이 되었고, 돌사닥다리로 둘러싸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상봉(上峰)을 따라 두타사(頭陀寺)로 내려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라산 최고봉을 부르는 이름은 전혀 없었는가. 고문헌을 뒤적이다 보면 한라산 최고봉에 관한 기록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1609년 제주판관으로 부임한 뒤 한라산을 올랐던 김치(金緻)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를 보면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상 위에 도착하여 혈망봉(穴望峰)을 마주하고 앉았다. 봉우리에는 한 개 분화구가 있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혈망봉은 최고봉인 특정 지점의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화구 주변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841년 3월부터 1843년 6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耽羅誌)』를 보면 혈망봉이 분화구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 최고 지점 일대를 뜻하는 봉우리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혈망봉=백록담 남쪽 변두리에 있는 봉우리에 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방을 다 둘러 볼 수 있다. 조금 동쪽에는 또 방암이 있는데 그 모양은 네모나 있고 마치 사람이 쪼아서 만든 것 같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혈망봉이 백록담이 아니라 특정 지점의 봉우리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1800년대 말엽 남만리(南萬里)가 지은 『탐라지(耽羅誌)』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1954년 9월에 펴낸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의 기록은 혈망봉이 한라산의 최고 지점을 뜻하는 이름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혈망봉=한라산 절정(絶頂)에 재(在)하다. 사방을 가히 통망(通望)할 수 있다. 동쪽에는 방암(方巖)이 있다. 그 형(形)이 방정(方正)하여 사람이 쪼아 만든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라산의 가장 높은 곳이 혈망봉임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고지도상에 혈망봉을 그려 넣은 지도는 드물다. 그러나 1702년(숙종 28) 이형상 제주목사가 화공을 시켜 그린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는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과 함께 ‘혈망봉(穴望峰)’을 뚜렷하게 표기하고 있다. 당시에 산 정상을 혈망봉으로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자료는 빈번하게 인용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한라산 최고봉을 일컫는 이름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기록들이다.
그러면 ‘혈망봉’이라는 이름은 왜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혈망봉으로 불려졌던 “구멍이 뚫린, 그래서 사방을 다 둘러 볼 수 있는 봉우리”의 존재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최고 지점인 절정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남서쪽에는 마치 거대한 장검(長劍)을 세운 듯한 바위들이 산체의 외륜을 감싸고 있다. 풍화 작용에 의해 깎이고 무너지며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들 거대 바위 중 옛날에는 윗덮개가 있어 구멍처럼 보였던, 그러나 지금은 무너져 버린 ‘혈망봉’ 바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항상 변하는 백록담의 깊이]
백록담은 한라산의 신비감을 더하게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한라산을 찾는 이들은 백록담을 보는 것으로 등반의 의미를 찾기도 했다. 백록담이 고갈되고 있다거나 담수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백록담에 대한 외경심이 깃들어 있다.
백록담에 관한 기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578년 백호가 제주의 경승을 둘러본 뒤 남긴 『남명소승』에는 “한라산 절정에 이르니 구덩이와 같이 함몰되어 못이 되었고, 둘레가 7~8리 가량 되었다. 아래(백록담)를 굽어보니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1601년 안무어사로 제주에 내려 온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에는 “정상은 함몰되어 꼭 솥과 같다. 사면에는 향그러운 넝쿨풀로 뒤덮여 있는데, 가운데에 두 개의 못이 있다. 얕은 곳은 종아리가 빠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 빠진다.”고 했다. 1609년 제주판관으로 내려 온 김치의 기록은 “사면의 봉우리가 성곽과 같이 빙 둘리어져 있고, 가운데에 못이 하나 있는데, 깊이가 한길 남짓(2m 정도)이다.”라고 했다.
300여 년 전인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둘레는 10여 리나 되고, 깊이는 800척이나 되는데, 그 밑에는 백록담이다. 원경의 둘레는 400 보(步)이고, 수심은 수장(수 미터)에 불과하다. 지지에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 했다.
1841년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조는 『탐라록(耽羅錄)』에서 “백록담의 깊이를 헤아리면 장(1장은 10척으로 약 2m)이 되지만, 물이 겨우 정강이를 적시는 얕은 경우가 전체 바닥의 5분의 1 정도”라고 하여 수심과 못의 둘레를 어느 정도 추정케 하고 있다.
또 1873년 제주에 귀양 왔다가 1875년 2월에 방면되자 한라산을 올랐던 최익현은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서 “정상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함몰된 곳이 있으니 이른바 백록담이었다. 얕은 곳은 무릎까지, 깊은 곳은 허리까지 찼다.”고 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01년 5월 한라산을 오른 독일인 지리학자인 지그프리드 겐테의 기록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는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한라산을 올랐고, 한라산의 높이를 1,950m라고 처음 측정한 지리학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의 기록에는 “나는 지름이 약 400m인 의외로 작은 분화구가 약 70m 높이의 가파른 벽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냈다. 바닥에는 겨울눈에 다 덮이지 않고 남겨진, 큼직한 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가 빛나고 있었다.”고 하였다. 겐테는 백록담을 ‘큼직한 물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등정했던 이은상은 『탐라기행』에서 “백록담은 정상 움푹 패인 곳에 크고 작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백록담에 관한 기록은 150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연대별로 남아 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못의 깊이는 얕은 곳은 정강이에서 무릎 정도며 깊은 곳은 허리에 차는데, 일부의 기록은 한길(약 2m), 또는 수장(수 미터)이나 된다는 표현도 있다.
또 못의 형태를 보면 400년 전 김상헌의 기록과 일제강점기 이은상의 기록은 두 개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일곱 사람의 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 겐테의 기록처럼 백록담은 ‘웅덩이보다 약간 더 큰 작은 호수’ 형태를 보인 날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500년 전의 기록에서 최근 60여 년 전까지의 기록을 놓고 보면 백록담 원형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담수량은 역시 예전보다 적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나의 호수 형태보다 두 개의 물웅덩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등반객이 크게 늘어나 답압(踏壓)에 의한 백록담 경사면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백록담의 물그릇’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라일보 한라산학술탐사단과 한라산연구소는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 관계자들과 2003년 7월 24일부터 이틀간 백록담 담수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한라산 정상 강우량은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44일 중 37일 동안 1,652.5㎜였다. 태풍 등의 특징적 기상 환경을 제외하고는 백록담에 가장 많은 담수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백록담의 만수위, 즉 집중 호우에 의해 가장 많은 양이 담수되었을 때의 최대 수위는 4.05m, 담수량은 56,500톤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조사 수치는 강우량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여름 1,652.5㎜의 비가 내렸을 때 최대 만수위는 4.05m였다는 기준점을 처음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얼음 창고로 사용된 구린굴]
한라산 속에는 선인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유적이 적지 않다. 『탐라지』에는 “빙고는 한라산 바위굴 속에 있는데 얼음은 한여름에도 녹지 않으며, 쪼개어 급용(給用)하고 다른 창고에 저장하지는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육지부의 석빙고와 달리 제주인들은 산 속에 있는 굴을 이용해 겨울에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꺼내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런 기록은 고문헌 몇몇 곳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면 얼음을 저장했던 굴은 어디일까. 『탐라지』 기록을 볼 때 굴은 제주목 관아와 가까운 산 속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주목사나 관찰사 등이 거처하는 관아에 얼음을 급용하기 위한 빙고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펴낸 『제주시 일원 천연동굴 분포조사보고서』를 보면 제주목 관아가 소재했던 지금의 제주시권에 있으면서 한라산 속에 있는 굴은 700~800m의 구린굴과 해발 600m에 위치한 평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보면 평굴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고 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할 경우 출입자가 엎드려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도 아니고, 얼음을 저장하기에도 적당치 않은 곳이다.
반면 구린굴은 한라산에 산재한 굴 중에는 수행굴(해발 1,400m 부근) 다음으로 고지대에 있어 얼음을 캐고 저장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더구나 구린굴은 관음사 코스에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한라일보 한라산학술대탐사팀은 지난 199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4차례 구린굴을 탐사한 바 있다. 이는 ‘하천과 계곡’ 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병문천 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병문천은 해발 1,530m 지점에서 발원한 뒤 세 갈래로 나누어져 내려오다 1,000m 지경에서 다시 합류하면서 본류를 형성한다. 구린굴은 이들 합류지점에서 150~200m 하류지점에 위치해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음사 등반안내소에서 약 1.5㎞ 정도 올라가면 등산로 바로 서쪽에 하천이 무너지면서 일부 구간이 지하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등반객들의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푯말을 붙여 놓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구린굴 입구이다.
구린굴은 하천의 바닥 아래 형성돼 있다. 즉, 구린굴은 하천 바닥 바로 밑 지하에 형성돼 있는 것이다. 동굴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린굴은 동굴이 무너지며 하천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 유일의 굴이기도 하다.
구린굴 탐사 결과 총 길이는 216m, 진입로의 너비는 대략 3m를 넘지 않는다. 진입로 양쪽에는 굴을 이용하기 쉽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돌들을 양쪽 언저리로 가지런히 정리한 흔적이 나타난다. 내부도 평탄 작업을 한 것처럼 잘 정리돼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높이 2~3m, 넓이 50~70여 평 정도 되는 광장이 형성돼 있다. 입구에서부터 일정한 크기로 자른 나무토막들이 깔려 있다.
구린굴이 굴빙고 역할을 했던 곳이라면 바로 구린굴 바로 위 지점에 있는 하천에서 얼음을 캔 뒤 굴 속 깊은 곳에 있는 넓은 광장에 저장했을 것이다. 평평하게 정돈된 진입로와 일정한 크기로 잘라낸 나무토막들은 얼음을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진 도구이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빙고는 사용이 지속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구린굴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굴 내부의 몇몇 곳은 2~3층으로 형성돼 있고, 지하수의 수로는 물론 2층 굴에는 작은 연못도 있다. 이 곳 역시 동굴 위인 하천에서 침투하는 누수에 의한 침식과 균열 현상이 보인다. 하천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굴 속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氷庫] 구실을 했던 곳을 보면 천장 곳곳에 균열된 틈새를 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굴 내부에 틈새가 생겨나는 것은 외부에서 물과 공기가 유입됨을 뜻하고, 이는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얼음 창고로서의 치명적 결함을 의미한다.
구린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면 선인들이 남긴 집 터와 숯 가마 터 흔적이 보인다. 얼음을 캐어 저장하고, 급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집 터는 아닐까. 숯 가마 터와 같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숯을 구웠던 이들은 얼음을 저장·급용하는 일 외에도 틈틈이 숯을 구워 관에 공급하거나 일반인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육지부와는 달리 천연의 동굴을 빙고로 활용했던 선인들의 지혜는 동굴의 하천화와 함께 막을 내리며 희미한 자취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활활 타오르는 봉화대의 불꽃, 왕관바위]
백록담에서 관음사 코스를 따라 조금 내려오면 왕관릉 북쪽 선단부인 표고 1,660m 지점에 왕관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한라산의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경승의 하나로 천하를 굽어보는 것과 같은 탁 트인 조망감을 맛볼 수 있다. 서쪽으로는 장구목과 삼각봉의 우뚝한 모습이 왕관릉과 더불어 웅장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왕관암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김종철의 『오름나그네』에는 “왕관암의 옛 이름은 ‘연딧돌’로, 연디는 연대(烟臺)를 지칭하는 제주방언”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봉수와 연대는 고대로부터 이용돼 왔던 통신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1150년에 처음 제도화되고, 이후 조선시대인 1419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제주도에도 이 무렵 모든 봉수와 연대가 새롭게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439년(세종 21)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한승순이 “봉화와 후망은 주(州)의 동쪽 김녕부터 주 서쪽 판포에 이르는 10개소와 대정현 서쪽 차귀부터 동쪽 거옥에 이르는 5개소,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지말산에 이르는 7개소에 한 봉화마다 5명을 나누어 정합니다. 또 연대(煙臺)를 쌓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척입니다.”라고 보고한 글이 보인다.
제주도의 봉수와 연대에 관한 고찰은 향토사학가 김봉옥의 「제주도의 방어유적」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왕관암과 연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왕관암은 과연 연대였는가.『탐라순력도』를 보면 한라산 정상과 가까운 동북쪽 높은 언덕에 불꽃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위치로 볼 때 탐라계곡의 동북쪽, 그러니까 왕관릉과 비슷한 지점에 연대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그러면 제주성 내에서 반나절 넘게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한라산 높은 지대에 연대(또는 봉수)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라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내달리다 우뚝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왕관바위에 올라 앞을 내다보면 그 의문은 금방 풀리게 된다.
「제주도의 방어유적」에 따르면 제주에는 50여 개의 봉수와 연대가 있었다. 이들 연대와 봉수는 해안과 중산간 지대를 연결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꽃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봉수와 연대에서 가장 빠르게 위급함을 알려야 하는 최종 보고처가 제주목 관아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제주 자체만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배로 출항해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제주-추자도-남해안을 잇는 비상연락 체계였다. 추자도에는 지금도 연대가 남아 있는데, 제주에서의 비상 상황을 육지부로 전달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추자도와 남해안에서 볼 때 제주에서 피워 올리는 횃불과 연기를 보려면 지대가 높은 곳에서 봉화를 올려야 한다. 낮은 곳에서 올리는 봉화는 한라산에 가려 식별하기가 어렵다. 한라산 정상 위로 연기와 불꽃이 보여야 제주의 위급한 신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왕관암은 연대 또는 봉수대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왕관암에 서면 제주의 산북 지방이 한눈에 들어오고 추자도를 비롯한 남해안이 어슴푸레 다가온다. 이러한 거리감은 추자도와 남해안에서 한라산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석양을 받으면 왕관바위는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물들어 ‘금빛 왕관’처럼 빛난다. 왕관암·왕관릉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 왕관처럼 빛나는 모습은 또한 활활 타오르는 봉화대의 불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라산 속의 봉수·연대가 왕관릉이 아니라 삼각봉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 보이는 기사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1875년 지금의 관음사 등반 코스로 한라산을 올랐던 최익현은 정상으로 향하던 중 “서쪽으로 조금 나아가니 깎아지른 절벽이 수천 길이다. 이른바 삼한 때 봉수의 터라 하나 가히 증거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기록을 볼 때 수천 길에 이르는 절벽은, 지금의 등반로로 본다면 왕관릉이다. 그런데 최익현은 서쪽으로 조금 나아가니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났다고 했다. 왕관릉은 탐라계곡의 동쪽에 있고, 서쪽은 개미목과 삼각봉으로 이어지는 방향이다.
당시 최익현은 제주의 선비들과 함께 한라산을 올랐는데 그들이 이곳을 삼한시대의 봉수 터라고 소개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봉수대의 위치가 어느 곳을 지시하는 지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영실은 계곡이 아닌 분화구]
영실은 한라산 경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다. 비경만이 아니라 온갖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현장이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유적이 산재해 있다. 영실에 관한 기록은 500년 전인 1545년 제주를 찾았던 임제가 남긴 『남명소승』이 처음이다.
임제는 과거에 급제한 뒤 제주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제주에 내려오게 된다. 그는 제주에 온 뒤 섬을 한바퀴 돌며 접한 한라산을 비롯한 풍광과 산물 등을 시문으로 남겼다. 영실에 관한 기록도 한라산을 등정하기 위해 존자암에 며칠 동안 머물며 영실을 둘러 본 뒤 남긴 글이다.
영실은 한라산 백록담 서남쪽으로 선작지왓을 지나 해발 1,3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제2횡단도로를 따라가다 영실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영실 주위에는 수많은 기암괴석들이 여러 형상으로 솟아 있어 장관을 이룬다.
한라산의 계곡은 어리목계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천(乾川)이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사철 물이 흘러 청아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병풍바위 부근에서 발원한 샘은 서북 방향으로 흐르다 영실을 벗어나며 남쪽으로 잠류(潛流)한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으로는 병풍바위가 웅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기암괴석들이 능선 위에 솟아 있다.
마치 돌부처 형상을 하고 있어 천불봉(千佛峰) 또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위풍당당한 장수들이 열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영실 내부는 물이 사철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양쪽에 절벽과 기암괴석들이 전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사람들은 이를 영실계곡이라 불러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3월 7일자 『한라일보』는 1면에 “영실은 계곡이 아닌 제주 최대 분화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라산학술탐사단이 화산지질학 전공자인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와 함께 영실지형도,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확인됐다는 내용과 윤성효 교수의 기고문도 실렸다.
조사 결과 영실은 장축 850m, 단축 800m 규모의 원형이며, 외륜은 현무암에 중앙은 조면암 돔을 형성하고 있는 분화구로 둘레 약 2㎞, 깊이 350m에 이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오랫동안 V자 형태의 계곡으로만 알고 있었던 영실이 둥그런 형태의 분화구라는 보도였다.
영실은 등산코스를 따라 가노라면 영락없는 계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중앙에 우뚝 솟은 오백나한의 암벽들로 인해 그 너머의 모습, 즉 영실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이다.
[영실에 전해지는 애달픈 설문대할망 전설]
흥미로운 것은 제주 선인들의 영실에 관한 예리한 안목과 풍부한 상상력이다. 영실에는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위해 거대한 솥에 죽을 쑤다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의 전설이 전해 온다.
옛날 어떤 부인(설문대할망: 한라산의 여신)이 아들 500명을 데리고 살았다. 식구들은 많은데 흉년이 들어서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먹지 않겠느냐.”고 재촉했다. 그래서 500명 형제 모두가 양식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아들들이 동냥을 얻어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 오자 다시 아이들에게 땔나무를 구해오라고 한 뒤 얻어 온 양식을 큰 솥에 넣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500명이 먹을 죽을 끓이기 위해 그 어머니는 가마솥 주위를 돌아가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만 죽 끓이는 솥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그런 사연도 모른 채 나무를 하러 갔던 아들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죽을 퍼내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이상한 뼈다귀를 발견했다. 이상하다 생각하던 아들들은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것을 알고,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그 사실을 안 막내는 하도 부끄럽고 안쓰러워서 집을 빠져 나와 서쪽으로 달려가다가 지금 한경면 고산리 앞 바다의 차귀섬에 들어가 몇 날 며칠을 울다 바위가 되었다. 집에 남은 형들도 너무나 비통해 울다 그 자리에서 모두 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영실 오백장군은 사실은 499장군인데 한 장군은 차귀섬에 있다고 전해 온다.
영실이 분화구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로 밝혀지기 훨씬 옛날부터 제주 선인들은 영실을 V자 형태의 계곡이 아닌, 거대한 솥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지형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먹을 죽을 쑤려면 이처럼 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실 속에 솟아 있는 숱한 기암들은 솥 속의 삐죽삐죽 드러난 뼈다귀와 같은 존재로 해석, 이처럼 애달픈 전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제주 불교의 발상지, 수행굴]
영실은 예부터 제주인들에게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는 영실을 둘러싼 주변이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낼 뿐 아니라 실제로 기구(祈求)의 터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남명소승』에 따르면 “절벽 아래는 옛 제단 터가 있는데 그 옆에는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지금부터 500년 전의 글인데, 당시에도 제단이 있었던 곳을 옛터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설치됐던 제단임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남명소승』에는 또 “흰 사슴을 탄 노인이 사슴 떼와 함께 영실에 자라는 불로초를 따먹기 위해 나타난다.”는 전설과 한 절제사가 실제로 백록을 잡아 바쳤다는 기사도 보인다.
영실은 제주 불교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것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이라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탐라지』에는 앞의 기록을 인용하며 원래 “존자암은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옮겼는데, 대정현 지경”이라 소개하고 있다. 또 1601년 한라산을 올랐던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또 수행굴을 지났다. 굴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고승 휴량이 들어가 살던 곳이다.”라는 기록을 남겼고, 1609년 한라산을 오른 김치 제주판관은 “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 하나가 있는데, 수행동이라 부른다. 옛날에 도승이 살았다고 하는데 부서진 온돌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1702년 등정했던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위에 수행동이 있다. 동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 부른다. 이는 옛 스님이 말한 팔정 옛터인데, 이를 존자암이라고 부른다. (중략) 존자가 암을 짓기는 고량부(高良夫) 삼성이 처음 일어난 때 비로소 이루어졌고, 삼읍이 나누어진 때까지 오래도록 이어졌다. (중략) 지금은 스님이 없고 헐린 온돌만 남아 있다.”고 기록했다.
이들 자료를 보면 존자암의 시원은 삼성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는데, 그 위치는 처음 영실 동남쪽 허리에 있었다가 영실 서쪽 10리 밖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고, 원래 존자암 주변에는 칠성대와 좌선암이 있으며, 이곳을 수행동(동굴 또는 골짜기)이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옛날 고승이 도를 닦았던 석굴이 있는데 곧 수행굴이며, 굴 안에는 20여 명이 들어 갈만하고, 지금은 부서진 온돌 자국만 남아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수행굴에 관한 기록은 옛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 수행굴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처럼 고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명소임에도 수행굴은 오랫동안 향토사학자와 같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거의 잊혀져 가던 존재였다. 그런데 2001년 12월 3일 한라산학술탐사팀이 도순천 발원지인 영실 탐사에 들어가면서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게 된 것이다.
탐사팀이 찾은 수행굴은 길이가 대략 20~24m, 최대 폭 5~7m 정도 되는, 마름모꼴 형에 가까운 굴이었다. 굴 가운데는 가로와 세로 약 2m, 두께가 30㎝ 쯤 되는 자연 판석이 놓여 있는데, 바닥과 전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판석 가장자리는 아궁이 흔적도 남아 있었다. 요리를 하며 판석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달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옛 기록에 남겨진 ‘부서진 온돌 자국’이었던 것이다.
동굴 구석에는 한 평이 채 안되지만 잘 정돈된 공간이 있다. 그 자리는 온돌로 사용됐던 자리보다 약간 높은 위치인데다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道)를 닦던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굴속에는 흥미로운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시대를 달리하는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이 발견됐다. 여러 시대에 걸쳐 사람들이 이 굴을 이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다.
굴 입구 왼쪽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 뼈가 확인되고, 오른쪽은 취사공간으로 사용했는지 검게 그을린 화덕자리가 남아 있었다. 다만 그 곁에 폭삭 삭은 나뭇단이 오랜 세월 인적의 왕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행굴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찾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존자암이 영실 밖 서쪽 10리로 옮겨간 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존자암이 옮겨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의 하나는 역시 사람이 오래 머물기 힘든 여건 때문일 것이다. 해발 1,300m에 있는 영실은 일년 중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추위와 습기가 엄습해 사람들이 머물기 힘든 곳이다. 해발 1,500m에 있는 수행굴은 더욱 그렇다.
한라산에서의 산림 도벌과 방목 금지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굴을 사용했던 이들이 오랫동안 굴을 찾지 않으면서 굴의 위치와 존재도 함께 잊혀져간 것이다. 특히 제주 4·3사건으로 한라산 입산이 금지된 것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한라산을 등정한 외국인, 겐테]
서양인으로서는 물론 외국인으로서 한라산을 첫 등정한 이는 지그프리드 겐테(Siegfroied Genthe)[1870~1904] 박사다. 겐테는 독일 출신으로 1901년 이재수의 난이 발생한 지 수 주일 뒤 한라산을 등정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던, 당시 독일 신문의 아시아 특파원이자 지리학 박사였다.
그는 영실 옛 등반 코스를 이용해 한라산을 올랐던 기행문을 남겨 외국인으로서 한라산을 처음 등정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그는 특히 한라산을 등정한 뒤 2개의 다른 기구를 이용해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최초로 측정하고, 이를 독일의 『퀼른신문』(1901.10.13~1902.11.30)에 연재함으로써 한라산을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겐테 박사가 제주 탐험에 나선 것은 온 섬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재수의 난이 진압된 1901년 5월이었다. 그는 이재수의 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제주에 파견된 황실고문 샌즈를 통해 제주도와 한라산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황실에서 제주목사에게 보내는 친서와 독일대사관의 협조 서한을 갖고 제주 탐험에 나서게 된다. 겐테의 제주 탐험에 관한 기록은 그의 유고집 『섬 탐험과 동해 중국에서의 표류』라는 제목의 책에 실렸다.
| 수정일 | 제목 | 내용 |
|---|---|---|
| 2018.07.04 | 기관명 현행화 |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 ->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 |
| 2013.11.29 | 띄어쓰기 수정 | [사라져버린 한라산 최고봉, 혈망봉]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혈망봉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혈망봉은 |
| 2013.11.29 | 오자 수정 | [제주 불교의 발상지, 수행굴] 신성스러운 분위기 -> 신성한 분위기 |
| 2013.11.29 | 오자 수정 | [제주 불교의 발상지, 수행굴] 실제로 기구(祈求)의 터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 실제로 기구(祈求)의 터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