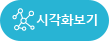디렉토리분류
- 표제어
- 분야
- 유형
- 시대
- 지역
- 집필자
-
참고문헌
-
가
- 가정집
- 간척7년소사
- 강릉지역의 서낭당연구
- 갯들
- 견훤의 출생과 사회적 진출
- 견훤의 출신지 재론
- 경기조은뉴스
- 경제편람
- 경향신문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고려시대 왕사·국사 연구
- 고려열조등과록
- 고부민란의 연구
- 고시레설화의 성격 고찰
- 고은 안지 선생의 생애와 학문
- 고인돌
- 고창군지
- 고창지방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마련 연구
- 공공기관 편람
- 공덕초등학교 학교운영계획서
- 공수도 교범 실전
- 공조정랑홍공묘갈명
- 관동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도록
- 관련자료
- 광부투쟁의 선구자
- 광해군일기
- 광활초등학교 학교운영계획서
- 교과서 한국문학
- 교육자료
- 구경전담의 민속학적 연구
- 구비문학개론
- 구비문학개설
- 구이-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국가자연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
- 국문학개론
- 국보
- 국어국문학사전
- 국어어휘론
- 국조방목
- 군국일본조선강점 36년사
-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 분야 불교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 금강(Ⅱ)지구 김제1-1공구 내 유적 2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 금강(Ⅱ)지구 김제1-1공구 토목공사구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금구읍지
- 금남초등학교 학교운영계획서
- 금만의 유적
- 금만의 유적지 순례
- 금산사
- 금산사 대불 금추에는 재건
- 금산사, 모악산
- 금산사지
- 금제의 전설
- 기독신문
- 기묘록보유
- 기억의 프리즘이 낳은 새만금 민족지
- 기억의 형상화와 지방사
- 기업체 현황
- 김제 Tour Guide Book
- 김제 금강(Ⅱ)지구 김제2-2공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 김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평선
- 김제 대동리 유적
- 김제 벽골제 발굴보고
- 김제 봉월리 기와요지
- 김제 산치리·양청리·나시리 유적
- 김제 석담리 봉의산·장신리·영상리 유적
- 김제 석담리-김제 공덕-전주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김제 황산대중골프장 시설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 김제·금구·만경향교지
- 김제·정읍 자연환경 생태조사보고서
- 김제경찰 1000년사
- 김제경찰서 청사이전 시급
- 김제관광안내도
- 김제군사
- 김제군지
- 김제뉴시스
- 김제디지털신문
- 김제땅 동학농민혁명
- 김제서예 삼백년사
- 김제서예의 전통과 현대
- 김제소방서 지평선축제에 따른 119소방안전체험 캠프 실시
- 김제시 농업조사보고서
- 김제시 자원봉사 원년 선포
- 김제시 지소 관련자료
- 김제시민의 신문
- 김제시보
- 김제시사
- 김제시의 찾아가는 이동봉사
- 김제시지
- 김제신문
-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 김제예총 30년사
- 김제우체국 개국 110주년 기념식 가져
- 김제우체국 고객사랑 문화예술작품 전시회 가져
- 김제읍지
- 김제의 문화재
- 김제의 유적
- 김제의 자연환경 생태조사보고서
- 김제의 전통
- 김제인의 유적
- 김제지방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 김제지역 지하수 기초조사보고서
- 김제지역의 독립운동사
-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뜬다
- 김취려
- 나
-
다
- 다큐멘터리 3일
- 담와 홍계희 연구
- 담와 홍계희의 정치적 생애
- 답사여행의 길잡이
- 대구지역 이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동여지도로 사라진 옛고을을 가다
- 대순회보
- 대지의 유언
- 대학국어
- 대한민국 웬만한 곳 다 있다
-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 대한민국림시정부사
- 대한민국모악서예대전 도록
- 대한민국의정총람
- 대한식물도감
- 대화교 선포문
- 데일리전북
- 도시공원관리자료
- 도시공원별 지구지정 현황
- 도암집
- 독립운동사
- 독립운동사자료집
- 독립운동자유공록
- 독립유공 전북 269인록
- 독립유공자공훈록
- 돌 및 생일 상차림 실태조사
- 돌과 나무 쇠에 새겨진 금석문이야기
- 동 기능전환 추진실적
- 동경대전
- 동국신속삼강행실효자전
- 동국여지승람
- 동래정씨 대호군파 명금산파보
- 동문선
- 동아교섭사의 연구
- 동아일보
-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현황
- 동진강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
- 동진농조 70년사
- 동진수리민속박물관 팜플렛
- 동진수리조합의 설립과정과 설립주체
- 동학·천도교
- 동학과 동학난
-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100년
- 동학농민혁명운동 연구
- 동학사
-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 동학사상의 이해
- 동학이야기
- 동학천도교 약사
- 동학혁명과 민중
- 동학혁명의 이념적 조명
- 두레공동체와 농민문화
-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 두레와 그 어원에 대한 재고찰
- 들판
- 디지털 김제
- 디지털 김제시대
- 디지털 김제신문
- 때로는 눈 먼 이가 보는 이를 위로한다
- 라
- 마
- 바
-
사
- 사례편람
- 사마방목
- 사법연감
- 사진을 통해 본 광활 마을의 생활사
- 사찰지
- 산경표
- 산경표를 위하여
- 산업동향 관련자료
- 살아 있는 백제사
- 삼강속록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삼국지
- 삼일운동사
- 상부마을 사람들의 삶과 앎
- 상여소리를 통해 본 노래의 형성
- 새마을운동신문
- 새만금 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 새만금 스토리텔링
- 새만금 지평선 소식
- 새만금방조제 이야기
- 새전북신문
- 생각 대백과
- 생활 속 과학 배우는 과학축전 대성황
- 서예문화연구
- 서울신문
- 석정 이정직
- 석정 이정직 유고
- 선거연보
- 선비와 농부
- 선조실록
- 설화학원론
- 성씨의 고향
- 성씨정착사
- 성종실록
- 세계무형문화유산과 민속예술
- 세계인 장보고와 지구촌 경영
- 세계일보
- 세시풍속을 통해 본 윤달의 의미
- 세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실록지리지
- 소방서 U-119 안심콜 서비스 운영
- 소방서 교동 추신사거리로 이전
- 소설 탄허
- 소요태능의 선사상 연구
- 소요태능의 시풍
- 소통하는 우리역사
- 속담 속에 숨은 과학
- 수맥과 명당으로 알아보는 풍수비급
- 숨은 꽃
- 숲이 좋으면 새가 날아든다
- 쉽게 읽는 개벽
- 스포츠 조선
- 승정원일기
-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 시공불교사전
- 시군구 백서
- 시민사회단체, 김제고 교사 징계 철회 요구
- 시사저널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천강씨대동보
- 신한국지리
- 신한민보
- 실록 동학농민 혁명사
- 실록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
- 실물제작을 통한 전통상복 연구
- 씨족원류
-
아
- 아름다운 김제
-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 아리랑
- 아리랑 연구
- 양귀자의 숨은 꽃 연구
- 언어학의 이해
- 여지도서
- 역사속의 우리옷 변천사
- 역사스페셜
- 역사적으로 본 벽골제와 아시아의 도작농업
- 역사학보
- 연감
- 연려실기술
- 연보
- 연합뉴스
- 열한 번째 밑 빠진 독 상 보고서
- 영조실록
- 오마이뉴스
- 오수형 의견설화의 연구
- 오주연문장전산고
- 완산고을의 맥박
-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 우리 농축산물 명품브랜드 모음집
- 우리 농축산물 참 좋아요!
- 우리 땅에서 익은 우리 술
- 우리 민요의 세계
-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음식 백가지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무 백가지
- 우리고장 양인물사
- 우리고장 역사문화의 전통
- 우리고장 인물사
- 우리고장 일제36년사
- 우리고장의 옛지명
-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비거
- 우리나무백과사전
- 우리소리를 찾아서
- 우리옷 이야기
- 우리의 전통예절
- 우리한국사
- 원불교 교전
- 원불교 용어사전
- 원불교개교반백년기념문총
- 원불교교사
- 원불교사전
- 원불교와 미륵신앙
- 원불교와 한국사회
- 원불교정전 길라잡이
- 원효를 찾아서
- 위대한 어머니의 산 모악산
- 유교의 나라 조선 그리고 김제 사람들
- 윤달의 민속심리와 주술·종교적 특성
- 윤흥길이 만들어내는 소시민들의 입담
- 음성민속지
- 음성지역 마을항목 콘텐츠 제작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
-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엿보기
- 의정활동 관련자료
-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 이민자가족과 같이하는 문화체험
- 이의민 정권의 성격
- 이자연묘지명
- 이코노미 21
- 이코노믹리뷰
- 이해학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
-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 인조실록
- 일성록
- 일제강점기 조선신사의 장소와 권력
- 일제하 농업생산기반의 형성과 일본인 대지주의 농장경영
- 임정과 이동녕연구
- 임진왜란
- 임진왜란과 해상의병
-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 임진의병의 성격
-
자
- 자산어보
- 장보고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 재해연보
- 전교조 김제지회 사무소 개소
- 전라도술 김제 백화주
- 전라문화연구
-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 전라북도 연해지역의 간척과 경관 변화
- 전라북도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재래시장의 형성·변화 과정과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금석문대계
- 전라북도의 민속예술
- 전라북도의 불교유적
- 전라북도의 자연환경
- 전라일보
-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 전북 도·소매업 백서
- 전북 백대명산을 가다
- 전북 세습무의 권역과 역할
- 전북 전통민속
- 전북 학생의 민족운동
- 전북, 근대의 자취
- 전북매일신문
- 전북문화예술자료집
- 전북문화재대관
- 전북미술약사
- 전북민담
- 전북백대명산을 가다
- 전북신보 6월부터 이동출장소 운영
- 전북연감
- 전북의 무가
- 전북의 민속
- 전북의 백대명산을 가다
- 전북의 전통사찰
- 전북의 정려·충효열비
- 전북의 정려비각 자료집
-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
- 전북의병사
- 전북인 투쟁 전사
- 전북인물지
- 전북인터넷대안신문
- 전북전래지명총람
- 전북중앙신문
- 전북지방의 백제고분 신자료
- 전북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 전북지역 무당굿의 유형과 특징
- 전북체신 25년사
- 전북향교원우대관
- 전쟁과 사회
-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 전주, 김제 자연환경 생태조사보고서
- 전주일보
- 전주최씨 도사공파보
- 전통 방짜 유기 제조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전통사찰총서
- 전통음식 모음집
- 전통주 기행 김제 백화주
- 전통촌락의 동수에 관한 연구
- 정여립 모반사건에 대한 고찰
- 정여립 모역사건의 진상과 기축옥의 성격
- 정여립 반역자인가, 혁명아인가?
- 정여립연구
- 정재집
- 정전대의
- 정조실록
- 제11회 김제지평선축제
- 제1회 김제지평선축제세부실행계획
- 제1회 김제지평선축제평가보고서
-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 제9회 모악문화제 전국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요강
- 제각각 포도축제, 통합해야 시너지
- 제복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 제조업체 현황
- 제주도의 농기구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 조망경관의 맥락으로 본 망해사와 진봉산의 장소성
- 조선 농촌사회의 연구
- 조선 중기 전북의 유맥에 대한 일 고찰
- 조선각도풍속개관
- 조선금석총람
- 조선독립운동
- 조선무속고
- 조선민요집성
- 조선불교통사
- 조선사
- 조선시대 도자기
-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수령직 교체 실태
- 조선시대 여성의 삶
- 조선시대 읍치의 진산·주산과 장소 의미
-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 조선어문경위
- 조선오만분지일지형도
- 조선왕조 오백년 이야기
- 조선왕조실록
- 조선을 뒤흔든 최대 역모사건
-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발전사
- 조선의 유사종교
- 조선의 취락
- 조선일보
- 조선전기 수령제도 연구
- 조선전기 지방행정제도의 정비
- 조선주조사
- 조선중기 수령의 관외 업무
- 조선창극사
- 조선초기 외관제도 연구
- 조선초기의 수령제 연구
- 조선초기의 수령제도
- 조선환여승람
- 조선후기 목민서의 편찬과 수령의 행정운영
- 조선후기 수령대책과 그 인사실태
- 조선후기 수령의 부임 의례
- 조선후기 수령의 성분과 교체에 대한 고찰
- 조선후기의 수령제 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 조세일보
- 종가의 제례복식에 관한 연구
- 종교연감
- 종교와 원불교
- 주간 소통신문
- 주해 명성경
- 중앙대백과사전
- 중앙일보
- 중외일보
-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 중종실록
- 즐거운 봄 문학기행
- 증보문헌비고
- 증산교 개설
- 지역농업 특화 사업계획서
- 지워진 이름 정여립
- 지진연보 2008
-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 팜플렛 및 홍보자료
- 지평선소식
- 진묵대사와 부설거사 그 유적지를 찾아서
- 진묵조사유적고
- 진포해전
- 진표율사 미륵신앙의 특징
- 진표의 미륵신앙
- 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 징게맹갱외에밋들 사람들
- 짚문화
- 차
- 타
- 파
-
하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학술강연자료집
- 한겨레21
- 한겨레신문
-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 한국 독립운동의 인물과 노선
- 한국 땅이름 큰사전
- 한국 복식 문화 사전
- 한국 전통음식
- 한국 진보세력 연구
-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 한국가톨릭대사전
- 한국고고학개설
- 한국구비문학개론
- 한국구비문학대계
-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 한국농기구고
- 한국독립운동사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 한국무속의 연구
- 한국문학사
-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 한국문화유산
- 한국민간신앙연구
- 한국민속대관
- 한국민속대사전
- 한국민속문화대사전
- 한국민속종합보고서
- 한국민속종합조사
-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 한국민족종교총람
- 한국복식사사전
- 한국부락관습사
-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 한국불교총람
- 한국사
- 한국사론
- 한국사의 아웃사이더
- 한국사이야기
- 한국사찰전서
- 한국설화문학연구
-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 한국식물도감
-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신종교조사연구보고서
- 한국신흥종교총람
- 한국음식의 맛과 멋
- 한국의 강
- 한국의 관제 신앙
-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 한국의 농기구
- 한국의 두레
- 한국의 명문종가
- 한국의 민속
- 한국의 민속놀이
- 한국의 부작
- 한국의 사찰
- 한국의 성지
- 한국의 신종교
- 한국의 신흥종교
- 한국의 자생식물
- 한국의 재래농기구
- 한국의 전통향토음식
- 한국의 정당정치
- 한국의 종교
- 한국의 촌락
- 한국의 풍수사상
- 한국인 부적신앙의 역사
- 한국인의 생활사
- 한국인의 장신구
- 한국장로신문
- 한국종교사상사
- 한국지리
- 한국지리지
- 한국지명요람
- 한국지명총람
- 한국지지
-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 한국하천일람
- 한글 속담 활용사전
- 한민족광부투쟁사
- 합간벽성지
- 해학 이기의 구국운동과 그 사상
- 해학성과 정치의식
- 해학유서
-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 현대기후학
- 현종개수실록
- 혜덕왕사진응탑비명
- 호남기독교 100년사
- 호남문학연구
- 호남삼강록
-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 호남의 산 국사봉
- 호남의 항일의병사
- 호남절의록
-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 호남지역 고인돌의 형식과 구조
- 호남평야 농부 김씨의 한평생
- 호남평야 벼농사 이야기
- 호남평야의 충적지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 홍계희의 경세서 편찬과 금석문 고찰
- 홍우전의 정치생애와 전주지역 정착
- 화보
- 환경법률신문
-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 후백제 견훤정권의 성립과 농민
- 후백제 금강에 관하여
- 후백제와 견훤
- 후백제의 멸망과 견훤
- 후천개벽사상 연구
- 휴정과 그 문도의 선정겸수관 연구
-
가
| 항목 ID | GC02601763 |
|---|---|
| 영어의미역 | The Field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 유형 | 작품/문학 작품 |
|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이윤애 |
[정의]
1987~1988년 임영춘이 전라북도 김제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난사를 그린 장편소설.
[개설]
임영춘이 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을 고발하는 작품의 시작은 『갯들』에서부터이다. 『들판』은 『갯들』에 이어서 미처 토로하지 못했던 민족의 아픔을 다시 덧붙여 써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처절했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을 고발하고 있다.
[구성]
『들판』은 상·하로 분책이 되었고, 594쪽으로 첫 번째 작품 『갯들』보다 분량이 늘어났다. 상권 304쪽은 1987년에 썼고, 하권 290쪽은 1988년에 증보했다. 『들판』은 거의 실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인 후쿠이 게키는 군의 요직에 있었던 일본의 최우수 두뇌파였고 후일 조선총독과 일본 수상을 역임한 고이소와 동기이다. 그가 군직을 버리고 간척지 사업에 투신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새만금 사업과 연관지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는 당시 농민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처절하게 살았던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용]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농민들은 노예 노동이라도 해야만 했다. 농민들은 오직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일을 해야 했다. 오른손으로 모내기를 하다가도 피고름이 쏟아지면 왼손으로 바꿔서 할 만큼 일을 했다. 곪은 손이 아려서 밤새 잠을 못 자는 부인네들이 많았다. 그래도 아침에는 곪은 손을 남편이 짜주고 다시 헝겊으로 매고 일터로 나왔고, 타작마당에서 바짓가랑이에 묻혀온 벼 알을 털어 식량을 감당하기도 했다. 한겨울에도 방파제를 쌓기 위한 노동에 동원된 농민들은 홑옷바람으로 돌을 지어 나르면서 추위에 떨기도 했다.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일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힘에 부쳐서 마침내 하나둘 쓰러져가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은 개구리와 뱀이 썩은 도랑물을 먹고 죽어갔다.
[특징]
작가는 치열한 고발정신으로 이 작품을 쓰고 있다. 특히 이 작품 앞서 써졌던 『갯들』에서 미처 못 다한 말들을 처절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제 침략의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사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비소설적인 요소가 소설 구성상의 미학을 압도한 생생하고도 절박한 기록문학으로서의 특징이 강하다.
[의의와 평가]
작품은 현장성을 강조한 사실적인 내용이 소설 구성상의 미학을 압도한 생생하고도 절박한 기록문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농토는 농민들의 생명의 근원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이 아닌 혼이 담긴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서해안 간척지 갯들을 중심으로 전 국토의 들판이 당하는 수난을 통해서 민족 수난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일제가 야비하게 전략을 세우고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장면, 마침내 방조제를 쌓는 노예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노예시장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흑인의 수난사를 보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일제의 지독한 횡포를 견뎌야 했던 이 민족의 아픔을 그렸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임영춘, 『들판』(대영사, 1987·1988)
- 장미영, 「새만금 문학의 원류를 찾아서」-임영춘의 『들판』(『더불어 사는 문화』, 문화원형콘텐츠연구회, 2009)
- 장미영, 「새만금방조제 이야기」-임영춘 장편소설 『들판』(『새만금 스토리텔링』-전주대학교 문화산업총서 3, 글누림, 2009)